
불화살이 쏟아지듯 뙤약볕이 내리쬐는 7월의 풀밭. 살아 있는 모든 것이 질식할 듯한 폭염 속에서 저 홀로 화사한 선홍색 꽃을 피우는 야생 난초가 있습니다. 자신을 집어삼킬 듯 이글거리는 태양과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맞서기에는 힘이 부친 듯, 온몸을 비틀어 마지막 한 방울의 색소까지 짜내어 보는 이를 한눈에 사로잡기에 충분히 매혹적인 꽃다발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소리쳐 외칩니다. ‘나는 이름 없는 잡초가 아니라 7월의 야생화, 타래난초’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산으로 들로 우리 꽃을 찾아다니는 이들 중에 야생화의 아름다움에 빠지게 된 계기로 타래난초와의 만남을 꼽는 이가 여럿 있을 만큼 첫인상이 강렬한 야생 난초입니다.
그런데 첫눈에 사람을 사로잡는 타래난초의 매력은 동서의 구분이 없나 봅니다. “나는 지중해를 굽어보는 넓고 기름진 평원에서 이 꽃을 찾았다. 털이 난 늘씬한 자태, 솜털이 보송보송한 줄기에는 꽃들이 나선형으로 줄기를 잡았다. 꽃부리가 하나하나 열리는 품이 마치 항성의 궤도에 키스를 하는 듯하다.” 프랑스의 식물학자 이브 파칼레(Yves Paccalet)는 <꽃의 나라>란 책에서 타래난초류의 하나인 스피란테스 스피랄리스(Spiranthes spiralis)를 처음 만났을 때의 감동을 전하면서 ‘님프의 하얀 젖가슴보다 더 아름다운 난’이라고 극찬합니다.

타래난초의 또 다른 매력은 국내 100여 종의 야생 난초 가운데 보춘화·옥잠난초와 더불어 자생지나 개체 수가 가장 많은 3대 난초로 꼽힌다는 점입니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높고 깊은 오지의 자생지를 굳이 찾아가지 않더라도 누구나 조금만 관심을 쏟으면 주변에서 만나 그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다는 보편성이 참으로 마음에 듭니다.
6월에서 8월 사이 양지바른 풀밭이나 묘지 근처 잔디밭 등지에서 10~40cm의 꽃대가 올라와 길이 4~6mm의 꽃이 이삭 형태로 다닥다닥 달리는데, 이때 꽃이 배열된 형태가 꽈배기처럼 나선형이어서 타래난초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수십 개의 꽃이 한쪽 방향으로 연이어 달릴 경우 길고 가는 꽃대가 한쪽으로 쏠려 쓰러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나선형 꽃차례를 택했다는 게 식물학자들의 설명입니다. 그 결과 ‘똬리를 틀 듯 비비 꼬이다’라는 뜻의 ‘타래’라는 우리말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셈이지요. 때문에, 처음 보는 순간 ‘예쁘다. 근데 이름이 뭐지?’ 하고 묻고서 ‘타래난초’라는 대답을 들으면 ‘아! 그럴듯하네’라며 고개를 끄덕이는 꽃이 바로 타래난초입니다. 꽃 색은 대체로 붉은색이지만 옅은 분홍색 등으로 다소간의 변이가 있기도 하며, 흰색의 꽃은 아예 흰타래난초라고 따로 불립니다.
Where is it?

앞서 설명했듯 전국이 자생지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야생화가 그렇듯 한번 알아보기 시작하면 여기저기서 흔히 만날 수 있는데 첫 대면이 어렵다. 타래난초 또한 초보자에겐 굉장히 귀하게 여겨지는 야생화다. 때문에 비교적 쉽게 만날 수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도 방법이다. 수도권 인근에서 알려진 자생지 중 하나는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천주교 소화묘원의 잔디밭이다. 인천 무의도 등산로 주변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충북 괴산의 이만봉 아래 ‘분지제’ 제방은 흰타래난초의 자생지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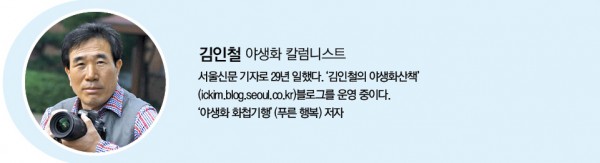



![[카드뉴스] 봄을 알리는 3월 전국 축제 리스트 9](https://img.etoday.co.kr/crop/345/230/2299200.jpg)

















































![[김인철의 야생화] 남도의 가을을 단풍보다 더 붉게 물들이는 ‘꽃무릇’](https://img.etoday.co.kr/crop/345/230/1131968.jpg)
![[김인철의 야생화] 염화시중의 미소로 꽃샘추위 내치는, 앉은부채!](https://img.etoday.co.kr/crop/345/230/1022522.jpg)
![[김인철의 야생화] 겨울이 깊어갈수록 존재감이 드러나는 '겨우살이'](https://img.etoday.co.kr/crop/345/230/1008185.jpg)
![[김인철의 야생화] 백두 평원에 흰 눈 쌓이듯 피는, 노랑만병초](https://img.etoday.co.kr/crop/345/230/991212.jpg)
![[김인철의 야생화] 척박한 바위 겉에 오뚝 서 꽃피우는, 좀바위솔](https://img.etoday.co.kr/crop/345/230/975249.jpg)
![[김인철의 야생화] 보랏빛 꽃다발로 거친 파도를 다독이는, 해국](https://img.etoday.co.kr/crop/345/230/956093.jpg)
![[김인철의 야생화] 스산한 가을 향이 강하게 묻어나는 꽃 ‘가는잎향유’!](https://img.etoday.co.kr/crop/345/230/944045.jpg)
![[김인철의 야생화] 야생난의 극치미를 보여주는, 백두산 애기풍선난초](https://img.etoday.co.kr/crop/345/230/909703.jpg)
![[김인철의 야생화] 연분홍 치마 흩날리며 핑크빛 사랑 나누는, 개정향풀](https://img.etoday.co.kr/crop/345/230/876706.jpg)
![[김인철의 야생화] 섬진강변 흩날리던 매화의 환생 매화마름!](https://img.etoday.co.kr/crop/345/230/859954.jpg)
![[김인철의 야생화] 폭포수의 벗이자, 춘설(春雪)과도 친구인 특산식물 '모데미풀'](https://img.etoday.co.kr/crop/345/230/840816.jpg)
![[김인철의 야생화] 자연의 신비, 생명의 외경을 일깨워주는 '너도바람꽃'](https://img.etoday.co.kr/crop/345/230/827027.jpg)
![[김인철의 야생화] “봄 봄 봄! 봄이 왔어요.” 소리 높이 외치는 보춘화!](https://img.etoday.co.kr/crop/345/230/805684.jpg)
![[김인철의 야생화] 순백의 신부 부케를 똑 닮은 꽃 백서향!](https://img.etoday.co.kr/crop/345/230/784440.jpg)
![[김인철의 야생화] 백의 얼굴, 천의 표정을 자랑하는 광릉요강꽃!](https://img.etoday.co.kr/crop/345/230/759743.jpg)
![[김인철 야생화] 한 해 야생화 탐사의 대미(大尾)를 장식하는 좀딱취!](https://img.etoday.co.kr/crop/345/230/741256.jpg)
![[김인철의 야생화] 가을을 유혹하는 립스틱, 하늘을 내려앉게 하는 물매화!](https://img.etoday.co.kr/crop/345/230/719775.jpg)
![[김인철의 야생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베를린까지 유라시아의 여름을 물들이는 분홍바늘꽃](https://img.etoday.co.kr/crop/345/230/703375.jpg)
![[김인철의 야생화] 한국의 야생화를 대표하는 특산식물 '금강초롱꽃'](https://img.etoday.co.kr/crop/345/230/682894.jpg)
![[김인철의 야생화] 천 길 바위 절벽서 새벽이슬 먹고 피는 지네발란!](https://img.etoday.co.kr/crop/345/230/661984.jpg)
![[김인철의 야생화] 산악인의 꽃 산솜다리](https://img.etoday.co.kr/crop/345/230/642317.jpg)
![[김인철의 야생화] 5월 높은 산 깊은 계곡을 화사하게 물들이다 '애기송이풀'](https://img.etoday.co.kr/crop/345/230/626761.jpg)
![[김인철의 야생화] 동강 할미꽃](https://img.etoday.co.kr/crop/345/230/608389.jpg)
![[김인철의 야생화] 제주 봄의 화룡점정 수선화](https://img.etoday.co.kr/crop/345/230/596807.jpg)
![[김인철의 야생화] 2월이면 변산바람꽃 이미 피어 새 봄이 지척에 와 있음을 알립니다](https://img.etoday.co.kr/crop/345/230/584361.jpg)
![[김인철의 야생화 산책] 통곡하고 싶은 계절, 사무치게 그리운 임을 닮은 꽃 '둥근잎꿩의비름'](https://img.etoday.co.kr/crop/345/230/538854.jpg)
![[김인철의 야생화 포토기행④] 한탄강 '꽃장포' …불면 갈아갈세라, 만지면 터질세라, 가냘픈 풀꽃이 핍니다](https://img.etoday.co.kr/crop/345/230/480423.jpg)
![[김인철의 야생화 포토기행⑤] 솔나리](https://img.etoday.co.kr/crop/345/230/487074.jpg)
![[신간]](https://img.etoday.co.kr/crop/345/230/489790.jpg)
![[김인철의 야생화 포토기행 ③] 민족의 성산 백두산 고산식물의 대표 '두메양귀비'](https://img.etoday.co.kr/crop/345/230/473492.jpg)
![[김인철의 야생화 포토기행 ②]접경지대 야생화 탐사의 백미… 고대산 칼바위 능선 ‘자주꿩의다리](https://img.etoday.co.kr/crop/345/230/468876.jpg)
![[김인철의 야생화산책 ①] 위험하면서도 황홀한 응시! 야생화의 만남이 시작됩니다](https://img.etoday.co.kr/crop/345/230/468328.jpg)

![[브라보★튜브] 오연수, 평양냉면 같은 영상 일기](https://img.etoday.co.kr/crop/345/230/229770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