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자는 서울 변두리의 용산구 보광동에서 태어나 스무 살까지 그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름답고 행복한 추억들은 모두 다 보광동에 묻어 두게 되었는데, 그 보광동의 중심에 오산중고가 우뚝 서 있다. 오산중고에 오랜 세월 가보지 않아서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 없지만 옛날에 필자가 어릴 때는 앞과 뒤에 모두 넓은 운동장이 있었다. 땅이 넓었기 때문에 온 동네의 행사란 행사는 모두 오산중고에서 하였다. 그리고 동네 아이들도 자전거 타기, 야구, 축구, 농구, 배구등 넓은 장소가 필요한 놀이는 모두들 오산중고등 운동장에 가서 했다. 그렇게 평일의 방과 후나 일요일에는 동네사람들의 차지가 되었다. 필자도 오산중고에서 많이 놀았다. 학교 뒤 운동장의 한강 쪽으로 끝자리는 낭떠러지이고, 그 아래는 강변북로, 그리고 그 너머가 한강이다. 그곳에는 아주 크고 오래된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우리 세 자매의 아지트였다. 우리 형제들은 오산중고등학교 뒤편 운동장에 자주 가서, 그 나무아래에서 놀다오곤 하였다.
어린 시절, 그곳은 참으로 행복한 곳 이었다
큰언니와 필자는 띠 동갑이다. 터울은 많았어도 우리형제들은 어릴 때, 소박하면서도 행복한 시절을 보냈다. 큰언니는 그 때, 대학교 3학년이었고, 작은언니는 중학교 3학년이었으며, 필자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다. 이렇게 우리 세 자매는 모두 6살 터울이다. 작은언니와 필자 사이에는 3살 터울의 작은오빠가 있는데,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다. 그 시절에는 남자와 여자가 노는 스타일이 달라서 산책은 주로 자매들끼리만 가기 일쑤였다. 큰언니와 작은언니는 노래를 잘한다. 큰언니는 교회 성가대에서 소프라노 파트를 하고 있었고, 작은언니는 학교에서 대표로 뽑혀서 KBS방송국 출연도 한 적이 있을 정도로 노래를 특히, 잘했다. 두 언니들이 노래를 부르면 화음이 잘 맞고, 참 아름다웠다. 필자는 지독한 음치라서 듣기만 하는데도 얼마나 행복했던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정신 줄 놓고 듣곤 했다. 그리고 우리 큰언니는 동화구연을 참 잘했다. 그 당시에 교회에서 주최하는 동화구연대회에 나가서 상도 탔다. 우리는 셋이서 둘러앉아 큰언니가 들려주는 동화를 얼마나 재미있게 듣곤 했던지! 들어도 자꾸만 또 듣고싶고, 또 듣고싶고 그랬다. 그러고 보면 언니들이 재능이 참 많았다. 큰언니의 동화구연이 끝나 갈 때쯤이면, 하늘에는 저녁노을이 물들어 간다. 노을은 시간에 따라 빛이 다 다르다. 밝고 노오란 빛은 찬란하고, 시간이 점차 지나면 점점 붉게 물들어 가는 것이 어찌나 슬프도록 아름답던지! 우리 세 자매는 넋을 잃고 넘어가는 노을빛에 취해 아무 말도 없이 그저 저녁노을만 바라볼 뿐이다. 그 시간은 각자 상상의 날개를 펴는 시간이다. 필자도 저녁노을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린나이에도 동화 한편 뚝딱이다. 그렇게 공상과 환상 속에서 맘껏 날개를 펴고 날아다니는 시간이 한없이 행복했다. 노을이 지고 땅거미가 지기 시작하면 세 자매는 정신을 차려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흰 머리칼이 여기저기 생겨나고, 나이든 지금도 그 시절이 그립다.
지금도 언제 어디서나 저녁노을만 보면 취한다
필자는 집을 살 때 항상 따져 보는 것이 있다. 바로 집의 ‘향’이다. 모두들 남향을 선호하지만, 필자는 앞이 탁 트인 동남향을 선호한다. 앞이 탁 트인 동남향은 그 집에 살고 있는 동안은 밖에 나가지 않아도 편하게, 아름다운 일출과 저녁노을을 맘껏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집안 창가에 서서 저녁노을을 맘껏 즐길 수 있는 집이다.
지금도 언제 어디서든 저녁노을만 보면 필자는 정신을 못 차린다.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노을빛 속에 들어가 어릴 때와 마찬가지로 상상의 날개를 편 채, 접을 줄을 모른다. 아마 그 속에서 대하 장편소설도 넉근히 쓰고도 남을 것이다. 땅거미가 져야만 비로소 정신이 돌아오니 말이다. 어릴 적 아지트는 오산중고등학교였지만, 스무 살 보광동을 떠난 뒤로는, 언제 어디서든지 찬란한 저녁노을빛이 ‘나만의 아지트’가 되었다.








![[Trend&bravo] 손주와 함께, 삼일절에 무료입장 가능한 곳 5](https://img.etoday.co.kr/crop/345/230/2299949.jpg)
![[기가 막힌 나만의 아지트 대공개] 언제나 그 자리에](https://img.etoday.co.kr/crop/345/230/932340.jpg)
![[기가 막힌 나만의 아지트 대공개] 7살이 되어가는 나의 방](https://img.etoday.co.kr/crop/345/230/932349.jpg)
![[기가 막힌 나만의 아지트 대공개] 일일부독서 구중생형극(一日不讀書 口中生型棘)](https://img.etoday.co.kr/crop/345/230/933552.jpg)
![[기가 막힌 나만의 아지트 대공개]](https://img.etoday.co.kr/crop/345/230/933574.jpg)
![[기가 막힌 나만의 아지트 대공개] 두물머리](https://img.etoday.co.kr/crop/345/230/933582.jpg)
![[기가 막힌 나만의 아지트 대공개] 쉐어 오피스](https://img.etoday.co.kr/crop/345/230/933663.jpg)
![[기가 막힌 나만의 아지트 대공개] 낚시터에서 힐링하다](https://img.etoday.co.kr/crop/345/230/934099.jpg)
![[기가 막힌 나만의 아지트 대공개] 뒷동산의 추억](https://img.etoday.co.kr/crop/345/230/934667.jpg)
![[기가 막힌 나만의 아지트 대공개] 전철서 죽 때린다](https://img.etoday.co.kr/crop/345/230/934765.jpg)
![[기가 막힌 나만의 아지트 대공개] 다락, 길, 내 집](https://img.etoday.co.kr/crop/345/230/934869.jpg)
![[기가 막힌 나만의 아지트 대공개] 관악산](https://img.etoday.co.kr/crop/345/230/934926.jpg)
![[기가 막힌 나만의 아지트 대공개] 우리 집에 두 개의 아지트가 있어요](https://img.etoday.co.kr/crop/345/230/935075.jpg)
![[기가 막힌 나만의 아지트 대공개] 호숫가 작은 나의 다락방](https://img.etoday.co.kr/crop/345/230/935106.jpg)
![[기가 막힌 나만의 아지트 대공개] 정동](https://img.etoday.co.kr/crop/345/230/93511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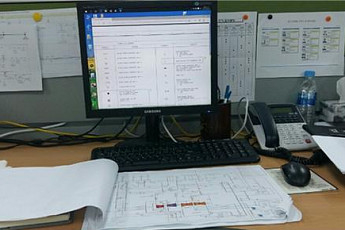
![[기가 막힌 나만의 아지트 대공개] 달리는 영혼 카페](https://img.etoday.co.kr/crop/345/230/935141.jpg)
![[기가 막힌 나만의 아지트 대공개] CM국제계약연구소](https://img.etoday.co.kr/crop/345/230/935169.jpg)
![[기가 막힌 나만의 아지트 대공개]다시 가고 싶은 다락방](https://img.etoday.co.kr/crop/345/230/937465.jpg)




![[브라보★튜브] 오연수, 평양냉면 같은 영상 일기](https://img.etoday.co.kr/crop/345/230/2297703.jpg)
![[카드뉴스] 봄을 알리는 3월 전국 축제 리스트 9](https://img.etoday.co.kr/crop/345/230/2299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