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누구야"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하지?
[먼슬리 이슈] 치매 상담 신청하세요~치매로 인한 변화를 깨닫는다 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 합니다. 시니어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홍명신 에이징커뮤니케이션센터 대표가 ‘치매 케어’에 관한 궁금증에 답합니다.

Q 저희 친정어머니는 82세입니다. 지금은 언니 집에 머무르면서 데이케어센터에 다니고 계십니다. 저는 주말마다 찾아뵙는데, 매번 “내가 누구야?”, “내 이름이 뭐야?” 하고 여쭤봅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딸인 저를 알아보지 못할까 봐 늘 두렵습니다. 이렇게 자꾸 물어보면 제 이름을,
저를 기억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말을 할 때마다 어머니가 조금 당황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A 우리의 돌봄은 사랑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현장입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 아버지가 치매로 아프던 시절, 저도 당신의 이름을 오래 기억하게 하고 싶어서 이름을 종이에 꾹꾹 눌러 같이 쓰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리 아버지 이름은 000인데 딸 이름은 뭘까요?” 하고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긴장된 표정으로 “네 이름은 홍명…”까지는 자신 있게 말했는데 마지막 한 자를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네 이름은 홍명…동”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는 ‘명동’이라는 또 하나의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때의 저처럼 치매 가족들은 알게 모르게 실수를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흔한 실수가 바로 “내가 누구예요?”, “내 이름이 뭐예요?”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신경과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치매로 아픈 분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나이, 이름, 계절, 연도, 심지어 현직 대통령 이름… 모두 인지기능을 측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문제는 이 장면을 본 가족들이 집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치매로 아픈 분이 어떤 치매를 앓고 있는지에 따라 증상은 다르지만, 기억장애는 공통으로 나타납니다. 기억을 점점 잃어가는 분에게 나와의 관계와 이름을 확인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시험 문제지를 내미는 일과 비슷합니다. 도서 ‘치매의 철학’ 저자이자 의사인 오이 겐은 “치매를 앓는 사람은 늘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보고 듣고 말한 것을 기억하고, 여기가 어디인지,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내 주위의 세상과 제대로 연결되는데, 그 연결고리가 희미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불안은 때로는 짜증, 분노, 혹은 허구의 세계로 이어집니다. 자기방어를 위해 화를 내거나 상상 속의 기억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어머니를 슬기롭게 돌보고 싶다면, 나와의 기억을 지켜주고 싶다면 다음 3가지를 실천해보세요.

첫째, 질문하지 말고 정답을 알려주세요.
내 질문의 목적은 어머니가 나를 잊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하지 말고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세요. 만날 때마다 “우리 아버지, 막내아들 최민우가 손녀 은서를 데리고 왔어요”, “김지영 여사님, 큰딸 강민정이랑 같이 식사해요” 이렇게 이름과 관계를 말해주세요. 대화 중간에도 “엄마 딸 수미가 사과를 사 왔는데 맛보세요”라고 언급하세요. 그렇게 자주 이름을 들려주고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 기억보다 더 진한 관계의 온기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둘째, 존중의 언어를 잃지 마세요.
치매 진단을 받고 일상생활이 서툴러지면 가족들은 ‘이제 아무것도 모르실 거야’ 단정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기억의 일부가 사라질 뿐, 감정과 자존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주 초기라면 내 이름을 아느냐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요양원 입소 같은 민감한 주제를 대놓고 말하거나, 어린 자녀를 다루듯 반말을 쓰거나, 행동을 교정한다며 꾸짖고 혼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의와 존중은 그분의 존엄을 지키고 불안을 가라앉히는 힘이 있습니다.
셋째, 이름보다 마음을 믿으세요.
언젠가 어머니가 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딸의 존재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옛 친구의 얼굴과 표정은 기억나는데 그 친구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 친구의 이름을 모른다고 추억마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딸의 존재는 어머니의 가슴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 단지 이름을 아는 것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이름 대신 딸의 어린 시절 모습, 목소리, 손길, 웃음을 기억할 것입니다. 딸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믿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치매 간병은 기억을 되찾는 여정이 아니라, 관계를 다시 배우는 시간입니다.
간병 초기의 시행착오 덕분에 저는 ‘명동’이라는 별명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도 누가 별명이 뭐냐고 물어보면 ‘명동’이라고 대답합니다. 아버지가 지어준 두 번째 이름. 아버지와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내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엉뚱하고 애틋한 별명도 없었겠지요.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실수하고 경험하면서 간병 생활의 추억과 내공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힘내세요!
치매 간병과 관련해 질문하거나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QR코드를 누르고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주세요.





![[만화로 보는 시니어뉴스] ‘장기, 바둑’ 치매예방 활동 10가지 기억하세요](https://img.etoday.co.kr/crop/345/230/2243316.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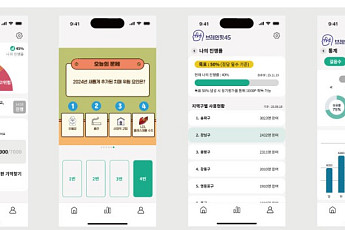



![[카드뉴스] 혹시 나도? 치매 초기 증상 셀프 체크리스트](https://img.etoday.co.kr/crop/345/230/2219476.jpg)

















![[Trend&bravo] 은퇴 후 문화 산책, 올해 문 여는 신상 미술관 4](https://img.etoday.co.kr/crop/345/230/2300724.jpg)

![[카드뉴스] 봄을 알리는 3월 전국 축제 리스트 9](https://img.etoday.co.kr/crop/345/230/2299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