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숲] 경북 김천시 청암사

청암사로 접어드는 길목부터 숲과 계류로 시원한 풍광이 펼쳐진다. 경내에도 다종다양한 수종이 아우러져 수목원을 연상시킨다. 비구니 행자들이 공부하는 아름다운 산사다. 내친김에 청암사에서 수도산 정상부 수도암 일대에 걸쳐 조성된 인현왕후길(총 9km)도 걸어볼 만하다.

장마로 불어난 수량에 계곡이 터질 듯 꽉 찼다. 억박적박 얽힌 바위들을 휘돌아 소쿠라지는 허연 물살로 음지이면서도 양양하다. 이쯤이면 절경에 맞먹어 폭염이 성가실 게 없다. 나무들은 궁금한가보다. 계곡으로 내뻗은 가지마다 살랑거리는 품이 은근한 손짓을 닮았다. 골바람이 스쳐 지나자 나무들이 사람처럼 들떴다. 출가도 설레는 여정일까? 세속에서 산문(山門)까지 멀리도 왔다. 이 절에 갓 출가한 수행자들이 산다. 청암사는 비구니 승가대학이다.
접때 왔을 땐 고요한 절이었다. 여린 싹눈 틔우는 봄나무처럼 청순한 행자들만 간혹 경내를 거닐더라. 오늘은 구경하러 온 사람이 숱하다. 김천시가 닦은 둘레길 ‘인현왕후길’에 청암사가 포함되면서 급작스레 드나드는 숫자가 늘었다. 찻집이 들어섰고, 현대식 해우소(解憂所)도 근사하게 새로 지었다. 뜨악하게도 경내의 일부 소로까지 아스팔트를 입혀 시커멓다. 원래의 흙길은 일부러 찾아와 걷는 이가 드문 덕분에 덜 밟혀 포근했다.

이 절이 그 절이었냐? 싱숭생숭하게 읊고 지나는 이가 있다. 그는 뭔가 섭섭한 게다. 불가에서 이르길, 외양에서 진리를 찾지 말라 했다. 부처마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 했다. 알고 보면 다 편의시설이니 깐깐하게 따질 게 없다. 분에 넘치는 치레라면 허세이겠지. 그러나 그저 수수하며, 여전히 수려한 것은 나무들이 지천으로 어우러져서다. 청암사처럼 온갖 나무들이 길차게 자라 개운한 풍치를 이룬 산사가 흔치 않다.
물소리와 매미소리가 연신 귀를 따라붙는다. 극락전 구역에서 발길을 멈춘다. 청암사 풍경의 절정이 여기에 있어서다. 담장 안짝에 어느덧 늙어 고졸한 전각이 있고, 바깥으로는 소로와 텃밭이 정갈하다. 극락전 지붕 저편 위로 큰 구름덩어리 흘러 산을 넘어가자 파란 하늘이 드러난다. 법문이 따로 있겠는가, 내 마음에 구름이 걷히면 부처가 보인다.

극락전 담장에 기대어 붉은 꽃을 토해낸 놈은 배롱나무다. 껍질을 벗고 또 벗기를 거듭해 누드처럼 티 없이 말짱한 수피를 드러내는 나무다. 절집에서 흔히 배롱나무를 심는 건, 일념으로 번뇌의 껍질을 벗고 깨끗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기를 배롱나무처럼 하라는 경책에서다. 절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어쩌면 모두 경책이자 법어다. 제 몸을 녹여 주위를 밝히는 초처럼 나무들은 꽃으로, 열매로 세상을 밝힌다. 물은 유유히 흘러 물처럼 살라 한다. 산은 만고에 명증한 무자천서(無字天書, 하늘이 만든 글자 없는 책)라 하였으니 청할 만한 족집게 레슨교사다.
이 절의 신참 비구니 행자들은 허투루 살지 않기를 맹세했을 것이다. 삶에 대한 회의에서 벗어나기로, 사사로운 감정의 늪에서 헤어나기로 다짐했을 것이다. 그러나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구들을 내려놓기 쉬울까보냐. 맛난 음식을 먹고 싶고, 달콤한 영화를 보고 싶고, 멋진 옷을 입어보고 싶고, 세간에서 습이 된 중생 유락을 다 떨치기 어렵다. 그걸 떨치면 깨달음이라 했다. 게다가 깨달음마저 떨쳐야 비로소 무애(無碍)에 이르러 견성이다. 이거야 원, 갈수록 첩첩산중이다.

해서, 공부하다 죽어라! 고승들은 그리 통렬하게 가르쳤다. 무슨 공부를? 혜암스님이라고, 장좌불와(長坐不臥)와 일일일식(一日一食)으로 유명했던 이는 경전이나 선(禪)은 공부거리로 족하지 않다고 봤다. ‘중들이 불상인지 나무토막인지에다 대고 관세음보살이나 외는데 부끄러운 줄 알라. 남을 위해 쉴 새 없이 손발을 놀리는 게 공부다.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불법(佛法)이니라.’ 이타적 행실로 차가운 세상에 군불 지피기. 이게 승려만의 일이랴. 청암사에 가거들랑 신참 행자처럼 나를 내려놓아 남 좋은 일을 시키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한 번쯤 꿈꾸어볼 일이다.
인현왕후는 이 절에서 수행승처럼 살았을까. 숙종의 계비(繼妃)였던 그녀는 왕자를 낳지 못한 데다 당쟁에까지 휘말려 폐위된 뒤 청암사에서 3년을 살았다. 전해오는 행장이 없어 아쉽다. 어쩌면 불법에 의지해 사무치는 고독을 눌렀으리라. 스물세 살 나이에 긴긴 유폐라니. 나무들 무성한 저 뒷산 숲에서 몸을 떨곤 했으리라. 간혹 숲에서 번뇌를 잊었으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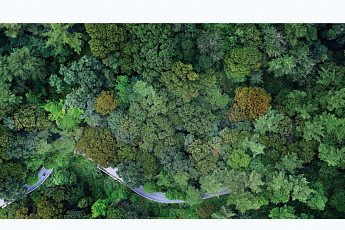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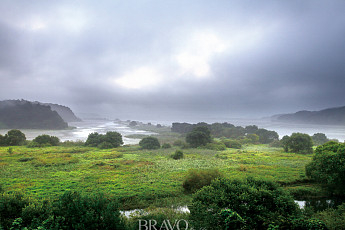








![[Trend&bravo] 은퇴 후 문화 산책, 올해 문 여는 신상 미술관 4](https://img.etoday.co.kr/crop/345/230/2300724.jpg)

![[카드뉴스] 봄을 알리는 3월 전국 축제 리스트 9](https://img.etoday.co.kr/crop/345/230/2299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