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철순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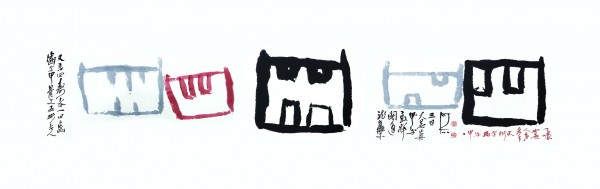
고재종은 농사를 지으며 시를 써온 전남 담양 출신의 시인입니다. 그의 빼어난 작품 중에서 ‘한바탕 잘 끓인 추어탕으로’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길지만 전문을 인용합니다.
우리 동네 성만 씨네 산다랑치논에, 그 귀퉁이의 둠벙에, 그 옆 두엄 자리의 쇠지랑물 흘러든 둠벙에, 세상에, 원 세상에, 통통통 살 밴 누런 미꾸라지들이, 어른 손가락만 한 미꾸라지들이 득시글벅시글 거리더라니, 그걸 본 가슴팍 벌떡거린 몇몇이, 요것이 뭣이당가, 요것이 뭣이당가, 농약물 안 흘러든 자리라서 그런가 벼, 너도 나도 술렁대며 첨벙첨벙 뛰어들어, 반나절 요량을 건지니, 양동이 양동이로 두 양동이였겄다!
그 소식을 듣곤, 동네 아낙들이 성만 씨네로 달려오는데, 누군 풋배추 고사리를 삶아 오고, 누군 시래기 토란대를 가져오고, 누군 들깨즙을 내오고 태양초물을 갈아 오고, 육쪽마늘을 찧어 오고 다홍고추를 썰어 오고, 산초가루에 참기름에 사골에, 넣을 것은 다 넣게 가져와선, 세상에, 원 세상에, 한 가마솥 가득 붓곤 칙칙폭폭 칙칙폭폭, 미꾸라지 뼈 형체도 없이 호와지게 끓여 내니
그 벌건, 그 걸쭉한, 그 땀벅벅 나는, 그 입에 쩍쩍 붙는 추어탕으로 상치(尙齒)마당이 열렸는데, 세상에, 원 세상에, 그 허리가 평생 엎드렸던 논두렁으로 휜 샛터집 영감도, 그 무릎이 자갈밭에 삽날 부딪는 소리를 내는 대추나무집 할매도, 그 눈빛이 한번 빠지면 도리 없던 수렁 논빛을 띤 영대 씨와, 그 기침이 마르고 마른 논에 먼지같이 밭은 보성댁도 내남없이, 한 그릇 두 양품씩을 거침없이 비워 내니
봉두난발에, 젓국 냄새에, 너시에, 반편이로 삭은 사람들이, 세상에, 원 세상에, 그 어깨가 눈 비 오고 바람 치는 날을 닮아 버린 그 어깨가 풀리고, 그 핏줄이 평생 울분과 폭폭증으로 막혀 버린 그 핏줄이 풀리고, 그 온몸이 이젠 쓰러지고 떠나 버린 폐가로 흔들리는 그 온몸이 풀리는지, 모두들 얼굴이 발그작작, 거기에 소주도 몇 잔 걸치니 더더욱 발그작작해서는, 마당가의 아직 못 따 낸 홍시알들로 밝았는데,
때마침 안방 전축에선, 쿵짝 쿵짝 쿵짜자 쿵짝 네 박자 속에 사랑도 있고 눈물도 있고 이별도 있다고 하며, 한번 놀아 보장께. 기필코 놀아 보장께, 누군가 추어대곤, 박수 치고 보릿대춤 추고 노래 부르고 또 소주 마시니, 세상에, 원 세상에, 늦가을 노루 꼬루만 한 해 넘어가는 줄도 모르고 한바탕 잘 노니, 아 글쎄, 청천하늘의 수만 별들도 퉁방울만 한 눈물 뗄 글썽이며, 아 글쎄, 구경 한번 잘 하더라니!
절로 흥이 나고 즐거운 이 시의 세 번째 연에 상치(尙齒)마당이 나옵니다. 상치는 이를 받들어 모시는 것이니 나이든 노인들을 위해 베푼 잔치마당을 말합니다. 가을철 미꾸라지 보양식으로 한데 얼려 흥겹게 한때를 보내는 마을공동체의 존노상치(尊老尙齒) 전통이 핍진하고 약여합니다.
예로부터 “조정에서는 작위만한 것이 없고 마을에서는 나이만한 것이 없으며 세상을 돕고 백성들의 어른 노릇함에는 덕망만한 것이 없다”[朝廷莫如爵 鄕黨莫如齒 輔世長民莫如德]고 했습니다. 신라 3대 유리왕부터 16대 흘해왕 때까지 썼던 왕호 ‘이사금’은 이가 많은 사람, 즉 연장자는 성스럽고 지혜로운 사람[聖智人]이라고 한 데서 유래된 치리(齒理)라는 말입니다. 유리왕과 탈해왕이 서로 왕위를 양보하다가 이가 더 많은 유리왕이 먼저 즉위한 다음부터 왕을 이사금으로 불렀다는 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흥겨운 상치모임이라도 이가 없으면 저작(詛嚼)을 할 수 없습니다. 못된 사람을 일러 불치인류(不齒人類), 사람 축에 들지 못한다는 말도 하지만 이가 없으면 사람 축에도 끼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없는 입으로 한없이 오물오물하며 식사를 하던 시골 할머니들 생각이 납니다. 그런 분들의 고통과 불편을 스스로 낙치(落齒)의 나이가 돼서야 알았으니 이가 나는 것도, 이가 빠지는 것도 다 인간이 철드는 일 중 하나인가 봅니다. 견마지치(犬馬之齒)란 개나 말처럼 헛나이를 먹었다고 겸손하게 하는 말인데, 지금 이 나이가 견마지치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의술이 발달해 치아를 때우고 새로 해 넣고 교정하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예전엔 이가 빠지면 그저 잇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지난해 어금니 한 개 빠지더니/올해는 앞니 한 개가 빠졌다/어느새 6, 7개가 빠졌는데/그 기세가 줄어들지 않는구나.” 당송 팔대가 중 한 명인 한유(韓愈·768~824)의 시 ‘낙치(落齒)’ 중 일부입니다. 마지막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네/이가 빠지는 건 수명이 다한 거라고/나는 말하네. 인생은 유한한 것/장수하든 단명하든 죽는 건 마찬가지.”
여섯 수로 이루어진 다산 정약용의 시 ‘노인일쾌사(老人一快事)’에도 치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산은 첫 번째 시에서 “늙은이 한 가지 유쾌한 일은/민둥머리가 참으로 유독 좋아라”라고 합니다. 이어 두 번째 시에서 “늙은이 한 가지 유쾌한 일은/치아 없는 게 또한 그 다음이라”고 한 다산은 마지막에 “유쾌하도다. 의서 가운데에서/치통이란 글자는 빼버려야겠네”라고 합니다. 이가 다 빠졌으니 이제 아플 일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 빠지는 게 유쾌할 리 없지만, 이렇게 달관과 해학적인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는 건강과 노화, 두 가지를 알려주는 인체 측정장치입니다. 노(老)를 쇠퇴나 쇠약이 아니라 노숙과 노련으로 해석하려 해도 빠진 이가 새로 날 수 없고 만든 이가 온전히 내 이와 같을 리 없습니다.
한국인들은 참 악착같이 살아왔습니다. 악착도 이와 관련된 말입니다. 작은이 악(齷)과 이 마주 붙을 착(齪)이 합쳐진 악착의 본뜻은 ‘작은이가 꽉 맞물린 상태’ ‘앙다물어 이가 맞부딪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를 앙다물고 악물고 살아온 게 아닐까요?
그러나 이제 나이 들고 여유가 좀 생겼으면 달라져야 합니다. 재미있는 시를 많이 쓴 오탁번 시인은 ‘문학청춘’ 올해 여름호에 발표한 ‘늙은이애’에서 이렇게 말했더군요.
‘애늙은이’라는 말은 있는데/‘늙은이애’라는 말은/왜 없을까//콩팔칠팔/흘리고 까먹고/천방지방 하동하동/나는 나는/늙은이애!//‘늙은이애’라는 말을/국어사전에 등재는 하지 않고/국립국어원은/낮잠 주무시나?
이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늙은이애’처럼 살아가는 게 보기 좋을 것입니다. 각자무치(角者無齒), “뿔이 있는 건(동물) 이가 없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가 없는 분들은 뿔이 있다고 생각하고 각자 자기 분야에서 두각(頭角)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무 서두르거나 다투지는 말고!








![[Trend&bravo] 손주와 함께, 삼일절에 무료입장 가능한 곳 5](https://img.etoday.co.kr/crop/345/230/2299949.jpg)

![[BML칼럼] 설계에 대하여](https://img.etoday.co.kr/crop/345/230/573664.jpg)
![[BML 칼럼] 꽃에 대하여](https://img.etoday.co.kr/crop/345/230/608555.jpg)
![[BML 칼럼] 청춘에 대하여](https://img.etoday.co.kr/crop/345/230/626759.jpg)
![[BML 칼럼] 이념에 대하여](https://img.etoday.co.kr/crop/345/230/642306.jpg)
![[BML 칼럼] 여행에 대하여](https://img.etoday.co.kr/crop/345/230/660969.jpg)
![[BML 칼럼] 남기는 것에 대하여](https://img.etoday.co.kr/crop/345/230/681867.jpg)
![[BML 칼럼] 음식에 대하여](https://img.etoday.co.kr/crop/345/230/703367.jpg)
![[BML 칼럼] 단풍에 대하여](https://img.etoday.co.kr/crop/345/230/740932.jpg)
![[BML 칼럼] 겨울에 대하여](https://img.etoday.co.kr/crop/345/230/771333.jpg)
![[BML 칼럼] 자식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https://img.etoday.co.kr/crop/345/230/784414.jpg)
![[BML 칼럼] 선물은 받아서 남에게 주는 것이다](https://img.etoday.co.kr/crop/345/230/805574.jpg)
![[BML 칼럼] 장수식유(藏修息遊), 쉬고 노는 게 다 공부다](https://img.etoday.co.kr/crop/345/230/826996.jpg)
![[BML 칼럼] 시간 속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라](https://img.etoday.co.kr/crop/345/230/840835.jpg)
![[BML 칼럼] 따로 또 같이, 그리고 따로](https://img.etoday.co.kr/crop/345/230/881219.jpg)
![[BML 칼럼] 어버이께 드린 효도 자식이 갚아준다](https://img.etoday.co.kr/crop/345/230/892675.jpg)
![[BML 칼럼] “스승이 못 되면 친구도 될 수 없다”](https://img.etoday.co.kr/crop/345/230/911432.jpg)
![[BML 칼럼] 유혹은 삶의 에너지다](https://img.etoday.co.kr/crop/345/230/876618.jpg)
![[BML 칼럼] “가을 깊은데 이웃은 무얼 하는 사람일까”](https://img.etoday.co.kr/crop/345/230/960615.jpg)
![[BML 칼럼] 책 버리기는 ‘삶의 숨 고르기’](https://img.etoday.co.kr/crop/345/230/943982.jpg)
![[BML 칼럼] 아무도 모르는 나는 과연 누구인가](https://img.etoday.co.kr/crop/345/230/976455.jpg)
![[BML 칼럼] 짧고 깊게, 꿈꾸어도 노래하지 않는 잠](https://img.etoday.co.kr/crop/345/230/926715.jpg)



![[브라보★튜브] 오연수, 평양냉면 같은 영상 일기](https://img.etoday.co.kr/crop/345/230/2297703.jpg)
![[카드뉴스] 봄을 알리는 3월 전국 축제 리스트 9](https://img.etoday.co.kr/crop/345/230/2299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