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철순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

이 봄에 교보생명이 운영하는 광화문글판에 새로 게시된 시는 함민복 시인의 ‘마흔 번째 봄’입니다. ‘꽃 피기 전 봄 산처럼/꽃 핀 봄 산처럼/누군가의 가슴 울렁여 보았으면.’ 이런 시입니다. 3월부터 5월 말까지 석 달 동안 봄과 꽃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 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러나 광화문글판은 언제나 시의 전문을 보여주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함민복의 시도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전문은 이렇습니다. ‘꽃 피기 전 봄 산처럼/꽃 핀 봄 산처럼/꽃 지는 봄 산처럼/꽃 진 봄 산처럼/나도 누군가의 가슴/한번 울렁여 보았으면.’
광화문글판은 원문에서 두 행을 줄이고 ‘나도’와 ‘한번’도 뺀 것입니다. 봄철에 맞는 글을 올리다 보니 부득이 꽃이 지는 대목을 뺀 것이지만, 시의 전체 의미는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함민복의 시가 말하는 것은 꽃은 피기 전과 피었을 때는 물론, 질 때와 완전히 졌을 때 등 사계절 내내 사람을 울렁이게 한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이미 마흔의 나이입니다! 울렁이는 내용은 서로 다릅니다. 꽃이 피기 전에는 기다림과 설렘, 꽃이 피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울렁이지만 꽃이 지기 시작하면 애달픔과 안타까움, 꽃이 지고 나면 슬픔과 아쉬움을 느끼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니까 꽃은 피어 있든 이미 져버려 내 마음속에 있든 언제나 사람을 기쁘고 즐겁게 하고 설레게 하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봄이 오는 즈음에 나태주 시인은 ‘3월’이라는 시에서 ‘어차피 어차피/3월은 오는구나/오고야 마는구나//2월을 이기고/추위와 가난한 마음을 이기고/넓은 마음이 돌아오는구나//돌아와 우리 앞에/풀잎과 꽃잎의 비단방석을 까는구나//’(하략)라고 했습니다. 이성부 시인의 표현처럼 봄은 ‘너, 먼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입니다.
봄은 꽃의 계절입니다. 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꽃’이라는 글자는 그야말로 꽃 같습니다. 우리말에서 중요한 것은 산 달 별 물 해 글 술 말 길 밥 돈 책 눈 귀 손 낮 밤, 이렇게 다 한 글자로 돼 있는데 꽃은 그 모양까지도 꽃을 닮았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저마다 하나의 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광화문글판의 문구로 함민복의 시를 고른 교보생명 관계자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사람인지 스스로를 성찰해 보고, 서로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관계를 만들어 보자는 뜻에서 선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시에 나오는 대로 사람을 분류하면 피기 전의 꽃인지, 핀 꽃인지, 아니면 지고 있는 꽃인지, 이미 져버린 꽃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보다도 나는 누구에게 꽃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꽃 이야기를 하면서 김춘수를 빼놓을 수 없지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지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김춘수의 꽃을 넘어서는 노래가 없을 만큼 이 시는 꽃에 관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지배하고 흡수하고 거의 통일했습니다.
꽃이라면 김춘수입니다. 진달래꽃이라면 김소월, 국화라면 도연명과 서정주, 매화라면 이퇴계, 모란이라면 김영랑, 접시꽃이라면 도종환, 새라면 박남수, 해라면 박두진, 달이라면 이태백, 별이라면 윤동주, 청포도라면 이육사, 바위라면 유치환, 사슴이라면 노천명, 연탄재라면 안도현, 이렇게 빼어난 시인들은 저마다 하나의 사물과 자연을 시를 통해 오로지함으로써 우리의 감성과 인식을 풍부하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시인이 아니지만, 인간은 누구나 시인일 수 있습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소논문 ‘작가와 몽상’(1908년)에 나오는 말처럼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시인이 숨어 있고 마지막 인간이 사라질 때 마지막 시인도 사라집니다. 칠레의 노벨문학상 수상 시인 파블로 네루다는 ‘나였던 그 아이는 어디 있을까/아직 내 속에 있을까 아니면 사라졌을까?’ 하는 시를 썼습니다. 꽃이 피는 봄에는 이런 생각을 더 할 법합니다.
그러니 꽃이든 새든 별이든 아니면 다른 무엇이든 나의 감성과 나의 언어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명한 시구를 암송하고 적절한 시·공간에 이를 활용하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체험과 언어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팔순이 넘어서도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백세의 나이로 시집을 내는 것은 모두가 자신의 체험과 언어로 세상과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어린 나이로 죽은 시인을 깨워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함민복의 시에 나온 것처럼 어떤 일과 사물의 이면과 양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에게 생과 사가 있듯이 꽃이 피면 지는 때가 있고, 해가 뜨면 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같은 비인 것 같아도 만물을 소생케 하는 봄철의 다스하고 부드러운 비가 있는가 하면 다 된 농작물을 망치는 차갑고 심술궂은 비도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의 사이와 그 경계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몰연도가 불분명한 조선 중기의 문인 송한필(宋翰弼)의 ‘우음(偶吟)’이라는 시를 읽어 봅니다. 花開昨夜雨(화개작야우) 花落今朝風(화락금조풍) 可憐一春事(가련일춘사) 往來風雨中(왕래풍우중).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번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젯밤 내린 비에 꽃이 피더니/오늘 아침 바람에 떨어지네./가련하구나, 봄날의 일이여/비바람 속에 왔다가 가는구나.’
비와 바람 사이에서 꽃의 한 생명이 끝났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지만 이를 표현한 앞의 두 행은 덧없는 인생을 비유한 명구로 꼽힙니다. 문장가로 이름이 높았던 송한필은 아버지의 신사무옥(辛巳誣獄) 고변이 무고로 드러남에 따라 가족들이 모두 노비가 되었고 그의 행적도 묘연해진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를 쓴 건지, 일종의 조짐으로 저도 모르게 이런 노래를 지은 건지 알 수 없지만 개화도 낙화도 알고 보면 모두 한순간의 일입니다. 김영랑이 ‘모란이 피기까지는’에서 말한 ‘찬란한 슬픔의 봄’인 것일까요.
이 꽃피는 계절에 조지훈의 낙화를 함께 읽습니다. ‘꽃이 지기로소니/바람을 탓하랴//주렴 밖에 성긴 별이/하나둘 스러지고//귀촉도 울음 뒤에/머언 산이 다가서다//촛불을 꺼야 하리/ 꽃이 지는데//꽃 지는 그림자/뜰에 어리어//하이얀 미닫이가/우련 붉어라//묻혀서 사는 이의/고운 마음을//아는 이 있을까/저어하노니//꽃이 지는 아침은/울고 싶어라.’
자신의 언어로 세상을 볼 것, 모든 사물과 일의 양면을 볼 것. 피어난 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다지게 됩니다. 낙화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개화를 볼 수 있어야만 꽃의 아름다움과 중요함이 더 커지고, 모든 것들이 나에게로 와서 새로 꽃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꽃보다 더 아름답다”는 말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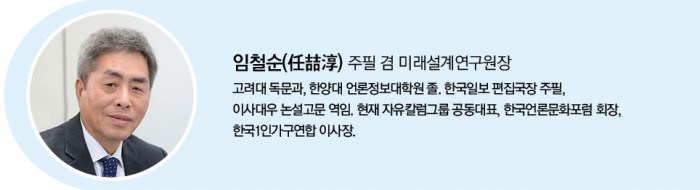







![[Trend&bravo] '봄동 비빔밥'이 이끈 봄 제철 채소 5선](https://img.etoday.co.kr/crop/345/230/2299206.jpg)
![[BML칼럼] 설계에 대하여](https://img.etoday.co.kr/crop/345/230/573664.jpg)
![[BML 칼럼] 청춘에 대하여](https://img.etoday.co.kr/crop/345/230/626759.jpg)
![[BML 칼럼] 이념에 대하여](https://img.etoday.co.kr/crop/345/230/642306.jpg)
![[BML 칼럼] 여행에 대하여](https://img.etoday.co.kr/crop/345/230/660969.jpg)
![[BML 칼럼] 남기는 것에 대하여](https://img.etoday.co.kr/crop/345/230/681867.jpg)
![[BML 칼럼] 음식에 대하여](https://img.etoday.co.kr/crop/345/230/703367.jpg)
![[BML 칼럼] 이[齒]에 대하여](https://img.etoday.co.kr/crop/345/230/719721.jpg)
![[BML 칼럼] 단풍에 대하여](https://img.etoday.co.kr/crop/345/230/740932.jpg)
![[BML 칼럼] 겨울에 대하여](https://img.etoday.co.kr/crop/345/230/771333.jpg)
![[BML 칼럼] 자식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https://img.etoday.co.kr/crop/345/230/784414.jpg)
![[BML 칼럼] 선물은 받아서 남에게 주는 것이다](https://img.etoday.co.kr/crop/345/230/805574.jpg)
![[BML 칼럼] 장수식유(藏修息遊), 쉬고 노는 게 다 공부다](https://img.etoday.co.kr/crop/345/230/826996.jpg)
![[BML 칼럼] 시간 속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라](https://img.etoday.co.kr/crop/345/230/840835.jpg)
![[BML 칼럼] 따로 또 같이, 그리고 따로](https://img.etoday.co.kr/crop/345/230/881219.jpg)
![[BML 칼럼] 어버이께 드린 효도 자식이 갚아준다](https://img.etoday.co.kr/crop/345/230/892675.jpg)
![[BML 칼럼] “스승이 못 되면 친구도 될 수 없다”](https://img.etoday.co.kr/crop/345/230/911432.jpg)
![[BML 칼럼] 유혹은 삶의 에너지다](https://img.etoday.co.kr/crop/345/230/876618.jpg)
![[BML 칼럼] “가을 깊은데 이웃은 무얼 하는 사람일까”](https://img.etoday.co.kr/crop/345/230/960615.jpg)
![[BML 칼럼] 책 버리기는 ‘삶의 숨 고르기’](https://img.etoday.co.kr/crop/345/230/943982.jpg)
![[BML 칼럼] 아무도 모르는 나는 과연 누구인가](https://img.etoday.co.kr/crop/345/230/976455.jpg)
![[BML 칼럼] 짧고 깊게, 꿈꾸어도 노래하지 않는 잠](https://img.etoday.co.kr/crop/345/230/926715.jpg)


![[브라보★튜브] 오연수, 평양냉면 같은 영상 일기](https://img.etoday.co.kr/crop/345/230/229770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