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와 예외사유 비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빈곤 문제는 사회적 화두다. 주택연금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로 꼽힌다. 고령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제도다. 브라보마이라이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주택연금 백문백답(2025년 4월판)’을 토대로 총 12회에 걸쳐 독자들에게 생활 속 주택연금 활용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에 담보주택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진행돼 철거로 인해 담보주택이 멸실되더라도 저당권 방식이라면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주택연금 지급정지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조합원 자격을 잃으면 연금도 더는 받을 수 없다. 분양을 신청하지 않거나 분양 신청을 철회하는 등 조합원 등 지위가 상실된 경우, 입주권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를 잃은 것으로 간주한다.
신·증축주택을 제공받기 위해 청산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령금액과 보증부대출 잔액 중 적은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잔여청산금이 발생하면 월지급금이 줄어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주택연금에 가입해 매달 80만 원씩 받고 있는 A씨의 집이 재건축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조합으로부터 청산금 6000만 원을 먼저 받았다. 이때 주택연금을 받으며 누적된 대출금이 4000만 원이라면, 청산금과 보증금대출 잔액 중 더 적은 금액인 4000만 원을 주택금융공사에 상환해야 한다.
청산금에서 2000만 원이 남았으면 그만큼 주택연금의 월 지급금이 줄어들 수 있다. 다시 말해, 매달 받던 연금 80만 원이 감액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저당권방식이 아닌 신탁방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했다면 공사의 신탁등기가 유지된 채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면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없다. 담보취득방식을 저당권 방식으로 바꾼 후에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이후에는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담보주택을 주된 거주지로 이용해야 한다. 다만 가입자나 배우자가 주택에 살지 않더라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예외 경우도 있다.
예외 인정사유(올해 3월 기준)를 보면 △질병치료, 심신요양 등을 위하여 병원, 요양시설 등에 입원 △자녀등의 봉양을 받기 위하여 타 주택 등에 장기체류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양로시설, 노인공동 생활가정)로 이주하는 경우 △관공서에 의한 격리, 수용, 수감 등이다.
담보주택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에 해당해 주금공의 승인을 받으면 부부 모두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것도 허용된다.
주금공은 “공사에서 인정하는 사유는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되어 확인할 수 있다”며 “해당 사유에 따라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리 입증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사를 하더라도 새집을 담보로 제공하면 계속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사 시점의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의 담보가치 차이에 따라 월지급금이 바뀔 수 있고, 초기보증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담보주택 변경 절차는 상담→조건변경 신청→감정평가의뢰(필요시)→담보주택조사→예비승인→매매계약→최종승인→잔금정산 등이다.



![[주택연금 백문백답] ①세금 혜택 유리하게 받으려면](https://img.etoday.co.kr/crop/345/230/2195601.jpg)
![[주택연금 백문백답] ②이혼·재혼 시 배우자 연금 지급 ‘NO’](https://img.etoday.co.kr/crop/345/230/2195608.jpg)
![[주택연금 백문백답] ③소유권 주금공으로 넘어가는 신탁방식의 장단점](https://img.etoday.co.kr/crop/345/230/2196925.jpg)
![[주택연금 백문백답] ④주택가격 평가 방법과 계약 종료 사유](https://img.etoday.co.kr/crop/345/230/2197238.jpg)
![[주택연금 백문백답] ⑥재개발·재건축 예정이라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확인](https://img.etoday.co.kr/crop/345/230/2197993.jpg)
![[주택연금 백문백답] ⑤대출금리, 기준금리에 가산금리 더해…보증료도 내야](https://img.etoday.co.kr/crop/345/230/2197956.jpg)
![[주택연금 백문백답] ⑦집값·물가 변해도 연금액 ‘그대로’](https://img.etoday.co.kr/crop/345/230/2198513.jpg)
![[주택연금 백문백답] ⑧종신·확정기간·대출상환 지급방식 유형 ‘다양’](https://img.etoday.co.kr/crop/345/230/2199398.jpg)
![[주택연금 백문백답] ⑨의료·생활비로 자금인출 가능…주택구입은 'No'](https://img.etoday.co.kr/crop/345/230/2199756.jpg)
![[주택연금 백문백답] ⑪주담대 상환용·취약고령층 우대형 등 ‘연금 3종세트’](https://img.etoday.co.kr/crop/345/230/2201100.jpg)
![[주택연금 백문백답] ⑫소상공인대출 상환용으로 주담대 이용 가능](https://img.etoday.co.kr/crop/345/230/2201218.jpg)
![[주택연금 백문백답] ⑬법적 나이 바뀌어도 주택연금은 그대로](https://img.etoday.co.kr/crop/345/230/2205104.jpg)

![[브라보★튜브] 전원주, 짠순이 그 이상의 매력](https://img.etoday.co.kr/crop/345/230/228406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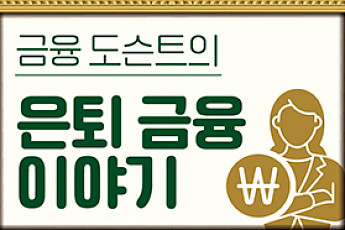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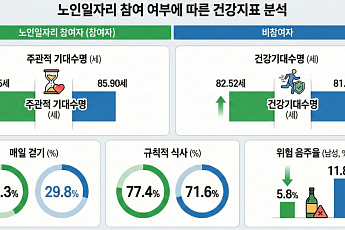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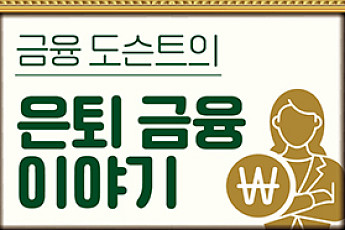

![[Trend&Bravo] 6070세대가 말한 노후 최대 걱정거리 5](https://img.etoday.co.kr/crop/345/230/228210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