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을 오르는 재미 중 하나는 명산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사찰을 만나는 일이다. 불자가 아니더라도 마음의 걱정을 한 줌 정도는 덜어놓고 올 수도 있고,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기분도 든다. 수행 중인 승려의 인사를 받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다. 대웅전으로 향할 때 거치는 누각의 그늘 아래 앉아 맞는 산바람도 사찰이 주는 선물이다. 전국 명산마다 유명한 사찰이 자리하고 있지만, 대표적인 곳은 역시 지리산이다. 지리산의 3대 사찰로 손꼽히는 쌍계사, 화엄사, 천은사를 취재를 핑계 삼아 다녀왔다.
자연의 멋 그대로 살린 쌍계사
주변 볼거리가 가장 많은 사찰이다. 섬진강을 따라가다 화개장터가 등장하면 화개천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서 볼 수 있다. 거슬러 올라가는 길은 너무나 아름답다. ‘하동 십리벚꽃길’이라 불리는 이 길은 벚꽃이 피는 시기가 아니더라도 늘 걸음을 멈추게 만든다. 길을 걷다 마주하는 강가에 펼쳐진 녹차밭의 광경도 압도적이다.
그렇게 오르다 보면 쌍계사가 등장한다. 쌍계사는 계곡의 지형을 그대로 살려 건물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모습이 이채롭다. 거대한 사찰을 만들겠노라며 산을 깎고 계곡을 메운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래서인지 늘 계곡 물소리가 경내를 불경처럼 맴돈다. 주변에 앉아 한참이나 물속을 바라보며 소위 ‘물멍’이 요즘 유행하는 이유를 깨닫게 된다. 물 흐르는 소리와 함께 압도적인 것은 절 안 곳곳 장식처럼 서 있는 대나무 숲이다. 쌍계사의 창건 전설에 왜 호랑이가 등장하는지 이해될 정도.
쌍계라는 절의 이름이 처음부터 쓰인 것은 아니다. 신라 성덕왕 21년(722) 대비와 삼법 두 스님이 칡꽃이 핀 눈 쌓인 계곡을 찾아 호랑이의 인도로 이 절을 세웠을 때는 옥천사로 불렸다고 한다. 그러다 신라 헌강왕 때 동명의 다른 사찰과의 혼선을 막기 위해 절 앞에 흐르는 시냇물의 이름을 따 쌍계라는 호를 받았다. 신라의 문인 최치원이 쌍계석문 4자를 써 바위에 새기기도 했다.
경내에는 국보 제47호 진감선사탑비(眞鑑禪師塔碑)가 버티고 서 있다. “도는 사람과 멀리 있지 않고, 사람은 나라에 따라 다르지 않다.(道不遠人, 人無異國)”라는 비문이 새겨져 있다.
마음의 안식을 원할 때 천은사
운전을 좋아한다면 알 만한 길 노고단로 초입에 위치한다. 이 길은 해발 1000m가 넘는 성삼재 휴게소까지 갈 수 있고, 길이 급격한 코너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와인딩을 즐기려는 많은 운전자들이 찾는다. 그렇다고 겁먹을 필요는 없다. 워낙 길의 굴곡이 심해 실제 차들의 운행 속도는 매우 느린 편이다.
성삼재에서 굽이치는 도로를 지나 천은사에 도착하면 매우 다른 광경이 펼쳐진다. 넓은 천은저수지의 잔잔한 물결과 공원처럼 펼쳐진 절 입구가 인상적이다. 산을 내려오며 격해진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는 느낌을 준다.
천은사로 가려면 감로천을 건너기 위해 다리를 지나야 하는데, 그곳에서 수홍루를 만나게 된다. 다리 위에 정자가 지어진 독특한 형태다. 저수지와 입구에 조성된 공원의 규모를 생각하면 절 자체는 아기자기한 편이다. 거대한 구조물들이 위압감을 주거나 엄숙함을 강요하는 모양새도 아니다. 주변을 지나던 등산객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안정감을 준다.
이 절 역시 통일신라 시대인 흥덕왕 3년(828)에 지어졌다. 임진왜란 이후 중건할 때 절터 주변에서 나오는 구렁이들을 잡았다가 화재와 재앙이 끊이지 않아 애를 먹었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온다. 조선 4대 명필의 한 사람인 이광사가 ‘지리산 천은사’라는 글씨를 써서 일주문 현판으로 걸었더니 그 뒤로 재앙이 그쳤다고 한다.
대표적 천년고찰 화엄사
지리산이 낯선 이라면 가장 먼저 들러야 할 곳이다. 사찰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지리산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등산로, 관광지로서의 매력도 충만하다. 특히 연기암까지 올라가는 등산로는 계곡과 숲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당일 등산 코스로 애용된다.
화엄사는 대표적인 천년고찰로 지리산에서 만날 수 있는 사찰 중 가장 큰 절로 손꼽힌다. 특히 중층으로 이뤄진 각황전은 전국 사찰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경복궁 근정전에 비교될 정도지만 그보다는 작다. 이 각황전은 국보 제67호로 지정됐다. 흥미로운 점은 일반적으로 사찰의 중심엔 대웅전이 가장 큰 규모로 무게중심을 잡는 것이 보통이지만, 화엄사의 경우 각황전이 대웅전보다 압도적으로 크다.
최근 화엄사에는 새로운 볼거리가 등장했다. 각황전 좌측 길로 오르다 보면 사사자삼층석탑을 만날 수 있다. 말 그대로 4마리의 사자가 받치고 있는 석탑이다. 탑을 완전히 해체해 새롭게 복원하는 데 무려 7년이나 걸렸다고 한다. 국보 제35호로 지난 9월 말 관람객에게 공개됐다.
사찰의 규모만큼이나 유물도 많다. 각황전만큼 거대한 바로 앞 석등은 국보 제12호고, 영산회괘불탱과 목조비로자나불삼신불좌상도 국보로 등록됐다.
‘사적기’에 따르면 화엄사는 신라 진흥왕 5년(544)에 연기(緣起)조사가 창건했다고 나온다. 문무왕 때는 의상대사가 왕명을 받아 석판에 ‘화엄경 80권’을 새겨 절에 보관했다고 한다. 이때 의상대사가 황금장육불상을 모신 곳이 지금의 각황전이다. 각황전은 조선 중후기인 숙종 때 지어진 건물로, 본래 장육전이 소실되어 복원하면서 숙종이 현판을 ‘각황전’이라 사액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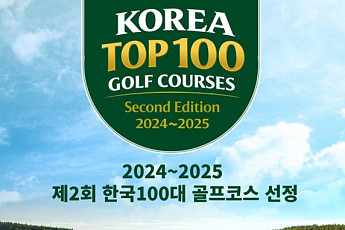











![[브라보★튜브] 오연수, 평양냉면 같은 영상 일기](https://img.etoday.co.kr/crop/345/230/2297703.jpg)
![[카드뉴스] 봄을 알리는 3월 전국 축제 리스트 9](https://img.etoday.co.kr/crop/345/230/2299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