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치지 못한 편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마음만 동동 구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이번 호에는 윤석산 시인이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제 문갑 맨 위 칸에는 아주 오래전에 시로 쓴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재작년에 딸내미한테 끌려 나가 이스탄불을 여행하면서 그 사람에게 줄까 하고 사온 나자르 본주우를 몰딩한 열쇠고리가 있고요.
편지를 시로 쓴 건 시인이라서가 아니라 구구절절 말하기가 뭐해 제 뜻만 전하려고 그리했습니다.
제가 처음 그녀를 만난 건 9년 전 정년퇴임을 앞두고 제주문화원에서 개설한 시 창작 강좌에서입니다.
마침 이웃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강의가 있는 날엔 그녀 차를 타고 다녔지요.
우선 편지 내용부터 소개해볼까요?
오늘 저녁엔 당신 창가에 흰 달빛을 걸어주세요.
내가 기를 쓰고 아흔아홉 강을 건너 되돌아온 건
다시 어쩌자는 게 아니라
용서하시겠다는 그 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평생 그런 적이 없는데 어쩌다 당신께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편지를 쓴 건 다시 만나 뭘 어쩌자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못 보낸 건 또 외면당하면 어쩌나 하는 ‘거절 콤플렉스’ 때문만이 아닙니다. 변명 같지만 평생 사랑이 뭔가 생각하고 사랑의 시만 써왔으면서 ‘완벽한 사랑’을 못해보고 떠날 수는 없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를 쓰고 ‘아흔아홉 강’을 건너왔다는 건 과장이 아닙니다. 그녀와 헤어진 다음 해 후두암에 걸려 성대를 잘라내고, 다시 3년 뒤 만성 백혈병에 걸려 지금도 병원을 들락거리는 벙어리 인생이니까요.
두 아이 엄마인 그녀가 제 마음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작품도 잘 쓸 뿐만 아니라, 자기 집도 어려운데 빵을 만들어 무인 카페에 갖다 놓고 팔아 장애인 복지단체에 헌금하고, 밑반찬을 만들어 독거노인들 현관 앞에 놔두는….
아니, 정년퇴임을 앞두고 미칠 듯이 밀려드는 쓸쓸함을 보듬어줬기 때문입니다.
퇴임을 앞둔 사람들이 흔히 느끼는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정부보다 3년 먼저 ‘한국문학도서관’을 구축하기 시작해 전송권傳送權)을 위탁한 문인이 1만5000여 명을 넘어서면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관계 기관을 쫓아다니며 지원해 달라고 매달리다가 거절당하고, 회원들에게 연회비 1만 원씩만 내서 우리 손으로 완성해보자고 애원했지만 몇백 명만 응해오고, 부채를 감당할 수 없어 ‘회생(回生) 신청’을 해야 할 처지라서….
미치겠데요. 사르트르(Jean Paul Sartre) 식으로 말하면, 내 가치는 타자와 ‘맺은 관계의 질(質)’에 의해 결정된다며 모든 것을 다 바쳐 살아왔는데 정부도, 같이 글을 쓰는 문인들도, 제자들도 외면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제 상황을 눈치 챈 그녀는 받아줄 수 있는 건 다 받아주데요. 절망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 동안 쓴 책들을 다시 고쳐 쓰기 시작하자 원고 교정을 자청하고, “뭐해요?” 하고 카톡을 보내면 “드라이브 가실까요?” 하고 끌어내고, 지는 해를 바라보는 제 눈빛이 흔들리면 “한잔하실래요?” 하면서 술집으로 안내하고….
사이다만 마시며 안주를 찢어 밀어놓고, 그러다가 간혹 새드르 웃는 그녀가 점점 제 마음속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기 시작하더군요. 어떤 때는 술잔 밑에 그녀의 입술이 얼비치고, 어떤 때는 꿈속으로 들어와 팔베개를 해주면서 토닥여줬습니다.
그러던 우리에게 이별이라는 낯선 얼굴이 불쑥 고개를 드민 건 이의로 ‘회생 신청’이 부결되던 2013년 7월 초입니다. 카톡을 받고 나온 그녀는 엊저녁 제 원고 교정을 보다가 남편하고 다퉜다는 겁니다.
“왜요?”
“‘언제 교정이 끝나나. 우리 교수님이 기다리시겠다’고 했더니, 이젠 ‘우리 교수님’이냐고 트집을 잡아서요….”
저도 얼핏 뵌 적이 있지만 그럴 분이 아니었습니다.
순간 중학교 때 처음 쓴 연애편지를 보고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떠오르더군요. “사랑은 책임지는 거고, 그럴 수 있을 때까지는 사랑해서도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고 하신.
그날 저녁 그녀 차 속에 핸드폰을 놓고 내렸지요 아니, 흘리고 내렸으면서도 그렇게 기억할 겁니다.
하지만 예상한 대로 그녀는 그 이튿날 우리 집 우편함에 핸드폰을 갖다 놓고는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안 받데요. 그리고 우연이겠지만 6개월 뒤에 이웃 마을로 이사를 가고.
지금은 어디에 사는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에 그녀가 교정을 봐줘 펴낸 ‘자서전을 덧붙여 고쳐 쓴 윤석산(尹石山) 시전집’ 첫 질이 나와 보내려고 카톡을 보내도 안 받아 못 부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그렇게 바뀌었느냐고요? 그리고 뭐가 ‘완벽한 사랑’의 추구냐고요? 이 글의 제목으로 붙인 ‘동 쥐앙’의 의미를 생각해보세요….
윤석산 시인
1946년 충남 공주 출생. 제주대학교 명예교수(문학박사, 시인). 한국문학도서관(www.kll.co.kr) 대표. 최근 저서로 ‘자서전을 덧붙여 고쳐 쓴 윤석산(尹石山) 시전집’이 있다.




![[브라보 Pick] 시니어의 픽 ‘중동 리스크·혈압 관리·봄나물’](https://img.etoday.co.kr/crop/345/230/2302154.jpg)
![[Trend&bravo] 은퇴 후 문화 산책, 올해 문 여는 신상 미술관 4](https://img.etoday.co.kr/crop/345/230/2300724.jpg)


![[카드뉴스] 봄을 알리는 3월 전국 축제 리스트 9](https://img.etoday.co.kr/crop/345/230/229920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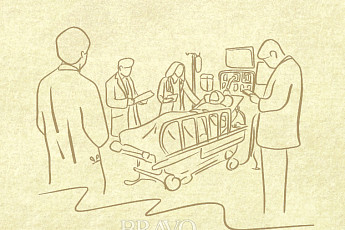


![[부치지 못한 편지] 쓸쓸한 만추의 어느 날 떠나버린 친구에게](https://img.etoday.co.kr/crop/345/230/1009519.jpg)





![[부치지 못한 편지]선배 송창식에게 후배 남궁옥분이 쓰다](https://img.etoday.co.kr/crop/345/230/117954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