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이라는 불청객은 본인뿐 아니라 주변인의 삶마저 크게 흔든다. 원망, 자책, 후회 등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모두가 함께 가라앉아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성숙의 시간으로 여기고, 같은 혼란을 겪는 사람들에게 솔직한 이야기를 전하는 이가 있다. 루게릭병으로 후천적 장애를 갖게 된 아버지의 투병기를 연재하는 웹툰 작가 긍씨(박은선, 31)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매일매일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그려내고 있다.

8년의 유학 생활을 정리한 후 지친 마음을 위로받고자 돌아온 집. 아버지 별씨(박한규, 69)가 지팡이를 짚고 서서 힘겹게 인사를 건넸다. “아빠가, 못 나가서, 미안해. 고생, 했지?” 어눌하고 느릿한 아버지의 음성. 아프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들은 것보다 심각하게 느껴졌다. 8년 만에 만난 별씨는 익숙하지만 가장 낯선 모습이었다.
처음은 손 저림이었다. 점점 반사신경이 둔해졌고, 손의 힘이 갑자기 풀리거나 바지를 갈아입을 때 균형을 잃는 등의 이상 증세를 보였다. 대학병원을 전전한 결과, 이전부터 앓고 있던 목 디스크로 인해 신경이 눌릴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듣고 디스크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에도 병세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결국 2017년 끝자락에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루게릭병을 진단받았다. 통제되지 않는 몸 안에 갇혀버린 별씨 가장과 보호자의 역할을 모두 떠맡은 어머니. 가족들은 현실 부정과 절망을 반복하며 긴 시간을 방황했다.
당연하게 누렸던 일상이 달라진 것은 당연지사. “마트에서 아래층으로 이동하려 무빙워크에 발을 디뎠는데, 이상했어요. 뒤를 돌아보니 아버지는 무빙워크를 타는 대신 뒷사람들에게 사과하며 황급히 몸을 돌리시더라고요. 당황스러운 마음에 몇 번이나 아버지를 불렀는데 말이죠. 살짝 짜증이 난 상태로 왜 말도 없이 사라졌냐고 물으니 ‘무빙워크가 너무 빨라서 발을 얹으면 넘어질 것 같았어’라고 하셨어요. 살면서 단 한 번도 무빙워크가 빠르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수단이 누군가에게는 엄두조차 나지 않는 존재라니. 제가 사려 깊은 시선을 갖추지 못했던 거죠.”
‘아픈 아버지’를 둔 딸을 향한 주변의 시선도 부담스러웠다. “일부 사람들은 지나치게 안타까운 시선을 보내요. 나를 위해 해봄직한 행동들에 제약이 걸리는 기분도 들었어요. 연애나 여행 같은 것들. ‘부모님이 아프신데?’라면서 그걸 사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에게 슬픔 혹은 분노만 있기를 바라는 것처럼요.”
흔들리는 시기도 있었지만, 긍씨는 자신의 전공을 살려 별씨와의 시간을 차곡차곡 기록하기 시작했다. “우리처럼 혼란을 겪는 사람들에게 공감과 위로가 되면 좋을 것 같았어요. 아버지도 ‘내 이야기가 누군가한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뜻깊은 게 아니겠느냐’고 하셨죠. 응원을 제일 많이 해주셨어요.”
‘난치병’을 벗 삼아
웹툰을 연재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긍씨는 약 5만 명의 독자들과 함께하고 있다. “공감과 응원의 메시지가 많이 와요. 병을 앓고 있거나, 가족이 투병 중인 분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덕분에 씩씩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하세요.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면 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타이밍이 훨씬 늦게 찾아왔을 것 같아요.”
창작자로서 어느 정도 자리 잡았지만 별씨 눈에는 그저 ‘막둥이’다. 매일 아침 ‘오늘도 은선이의 하루가 희망의 날이 되길 바라며. 아빠 딸로 태어나서 정말 고맙다’와 같은 사랑이 가득 담긴 메시지가 도착한다. “아버지는 당신의 난치병을 친구라 부르시더라고요. 이놈을 벗으로 삼으면 조금은 사뿐해진 마음으로 더 자주 웃을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그 강인함의 경도를 제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저희한테 긍정적으로 씩씩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가는 것이 마지막 목표라고 하세요. 저도 이 상황을 덫에 걸렸다고 생각하기보다 태풍이 불어와도 중심을 잃지 않고 굳건히 버틸 수 있는 닻이 생겼다고 여기기로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받은 사랑을 힘껏 돌려줄 수 있는 순간이 왔다고 봐요.”
긍씨는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이 투병 중이라면, 병이 찾아온 건 당신 탓이 아니라고 말해주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지나간 일을 다시 꺼내서 어떤 게 문제였는지 원인을 찾아봐야 소용없어요. 오히려 당사자는 그 상황에서 스스로 몸을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힐 수 있거든요. 병은 잘못하지 않아도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또 병이 생겼다고 해서 어제까지 잘 웃던 사람이 오늘부터 계속 울어야 한다는 법은 없어요. 본인의 희로애락을 모두 소중히 여겨야 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죠. 노년에 찾아오는 비극으로 치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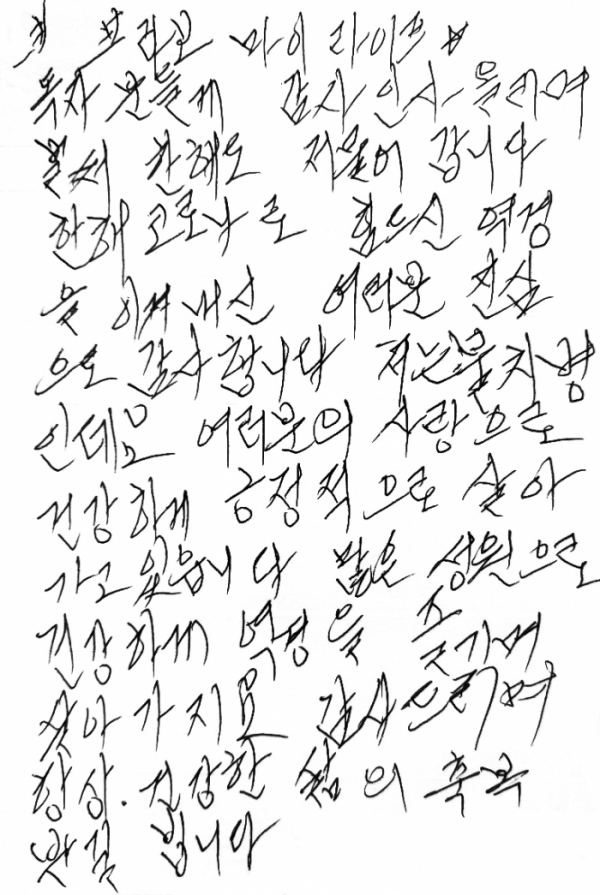











![[브라보★튜브] 오연수, 평양냉면 같은 영상 일기](https://img.etoday.co.kr/crop/345/230/2297703.jpg)
![[카드뉴스] 봄을 알리는 3월 전국 축제 리스트 9](https://img.etoday.co.kr/crop/345/230/2299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