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인물사진을 하며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아름다움을 비교 전시하는 일을 위해 그랜드캐년과 요세미티 국립공원 하프 돔을 촬영할 때였다. 쉽게 만날 수 없는 웅장함에 매료되어 낮뿐 아니라 밤의 신비한 달빛으로도 그 풍광들을 담아보았다.
하늘도 구름도, 심지어 휘영청한 보름달과 바람까지도 잘생긴 그랜드캐년과 요세미티의 아름다운 선을 기꺼이 받쳐 주었다. 특히 하프 돔은 태양이나 달의 각도에 따라 색과 질감을 바꾸며 그 자태를 뽐냈다.
그런데 예외가 있었다. 아무리 작은 어린아이라도 그 멋진 풍광에 들어가게 되면 큰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다. 심지어 사람의 형태가 단순한 실루엣일지라도 짧은 순간에 주객이 바뀐다는 것이다. 위용을 자랑하던 하프 돔도 즉시 그 위치가 바뀌어 사람 앞에서는 배경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내 눈에만 그렇게 보였을까?
대부분의 경우 사진의 구도에서 내 시선을 끄는 것은 인간이다. 아무리 웅장한 풍광의 구도를 잡고 있을 때라도 카메라의 뷰파인더에 사람이 들어서게 되는 순간, 사진 속에 시선을 끄는 많은 요소들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는 인간의 존재가 커진다.
이렇게 사진 작업을 하며 사람의 형상이 갖고 있는 힘을 알게 되었다. 사람만이 갖고 있는 권위이다.
아름다움이라는 관점에서만 본다면 상징적인 것이 꽃이다. 그러나 꽃의 아름다움은 사람과는 다른 차원이다. 인물사진을 하다보면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가치가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말에 ‘화초 화초해도 인화초가 최고’라는 말이 그런 뜻이 아닐까?
기관의 초청으로 중앙아시아의 아름다움을 찾기 위해 아내와 함께 떠났다. 그때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만난 한 소녀의 사진이다. 중앙아시아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착하고 수줍은 소녀의 미소, 어린 소녀임에도 사진 속에서 그 존재는 주위 풍광과 잘 어우러진다.
내게 투르크메니스탄의 첫인상은 외국인의 방문을 반기지 않는 나라라는 것이었다. 몇 명 안 되는 우리 일행의 입국 수속에 4시간이 걸렸으니 말이다. 교통편도 불편한 나라였다.
하지만 그만큼이나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순수함을 가지고 있었다. 사진 속 소녀에게서는 세련된 아름다움과는 다른 맑고 투명함이 보이지 않는가. 그건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를 감싸고 있던 보호막 같은 것이다. 몸을 낮추어야 보이는 아름다움을 소녀에게서 보았다.
아름다움은 오랫동안 지켜봄으로써 표면만이 아니라 내면까지 보일 때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바쁜 나머지 사람의 내면은커녕 표면적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산다. 인터넷, 스마트폰, SNS가 발달하면서 얼굴을 직접 마주할 기회는 더욱 적어졌다. 그러니 그 사람을 잘 안다고 말은 하지만, 그 사람의 아름다움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다 보니 막상 인물 사진을 찍으려 해도 어떻게 해야 잘 나올지 감을 잡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 사진을 주제로 청와대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사진전시를 했다.
한·중앙아시아 문화교류 축제라는 이름으로 비단의 향연을 국립극장 달오름극장과 씨너스 영화관(단성사)에서 중앙아시아 나라들의 공연과 영화를 상영하였고,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는 그렇게 촬영한 100여 점의 사진으로 전시를 하게 된 것이다. 마침 이 행사 바로 전에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 이뤄져 투르크메니스탄의 풍광을 따로 추려 의전에 맞춰보았다.
청와대 영빈관을 들어선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의 첫 마디 “이 사진들 우리나라 같은데….” 그리고 이어 곧 이명박 대통령과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수행각료들과 함께 웃음바다로 빠져들었다. “당신네 나라 낙타는 모두 혹이 하나냐? 그럼 어떻게 타냐?”는 이명박 대통령의 진지한 질문, 그리고 이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이 사진도 우리나라 맞나요?”에서는 정말 웃음이 빵 터졌다.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오래 사진 전시가 이어졌다.
전시는 이 소녀의 등신대(等身大) 사진으로 마무리하였다.
아름다움이라는 관점에서만 본다면 상징적인 것이 꽃이다. 그러나 꽃의 아름다움은 사람과는 다른 차원이다. 인물사진을 하다보면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가치가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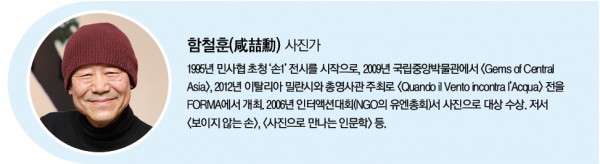




![[카드뉴스] 봄을 알리는 3월 전국 축제 리스트 9](https://img.etoday.co.kr/crop/345/230/2299200.jpg)






![[브라보★튜브] 오연수, 평양냉면 같은 영상 일기](https://img.etoday.co.kr/crop/345/230/229770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