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공감] MZ세대 딸이 쓰는 아버지 이야기

언제나 아빠가 달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달리기를 시작하고부터. 기억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봄, 저는 고향인 강원도 홍천에서 열린 ‘힐링 마라톤’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홍천군국민체육센터를 기점으로 산악 임도를 왕복하는 코스였는데, 그때 출발지에 계셨던 아빠는 제가 임도를 빠져나와 도로 위로 모습을 드러내자 반대편에서 제가 있는 곳으로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만나자 다시 방향을 바꿔 저와 함께 골인 지점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셨습니다.
그 기억이 참 강렬했는지 아빠가 달리는 모습을 계속 보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그 후로 아빠의 달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의 아빠는 거의 양복 차림을 하고 계셨고, 그 모습으로 앉아 계시거나 서 계실 뿐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빠는 무려 40여 년을 우체국에서 일하셨거든요. 취미로 이따금 특이한 나무나 돌을 방 한구석에 모으시기도 했지만, 그럴 때조차 아빠는 양복 차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아빠가 양복이 아닌 추리닝을 입고 계신 모습을 자주 보기 시작한 건 아빠가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였습니다.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하루 9시간을 사무실에서 보냈던 아빠는 갈 곳을 잃고부터 휴대폰에 만보기 앱을 깔고 집 근처 강변을 천천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는 사람처럼 정신없이 걷고 걸었습니다. 그래봤자 하루 만 보였지만, 이전의 아빠를 아는 저로서 이러한 변화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빠는 며칠 뒤 담배도 끊으셨습니다.
출퇴근을 하기 위해 단순히 이동하는 것이 운동, 아니 활동의 전부였던 아빠가 하루 만 보씩 걷기 시작한 것은 공허함을 달래고 채우기 위해서라는 건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걷느냐’는 물음에 아빠는 ‘하루 만 보씩 걷지 않으면 내 인생이 망할 것 같다’고 농담 섞인 대답을 돌려주셨습니다. 한때 모든 것이었던 세계에서 자신만 쏙 빠져나온 느낌이었을 겁니다.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그사이 아빠는 몸을 움직이는 일의 뿌듯함을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최소 ‘걷는 것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루 만 보씩 걷지 않으면 내 인생이 망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던 아빠. 아빠가 만 보씩 걷는 것을 넘어 저처럼 달리길 바라는 마음에 평소 아빠 앞에서 건강, 무병장수, 힐링, 다이어트, 상쾌한 컨디션, 삶의 질 등 달리기가 주는 좋은 점에 대해 거듭해서 떠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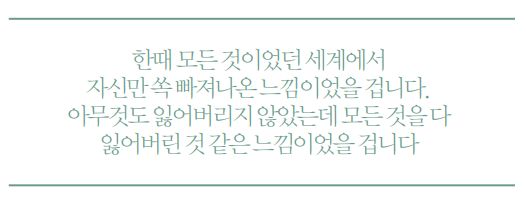
하지만 아빠는 그때까지도 절대 달리지 않았습니다. 하루 만 보씩 걷는 것만으로 아빠는 인생의 불안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거리를 더 걸을 필요도 없을뿐더러 달릴 필요성은 더더욱 느끼지 못하셨죠.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달리는 것이 걷는 것보다 훨씬 힘들기 때문입니다. 어떤 중대한 계기가 있지 않고서 하루아침에 달리는 것 또한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위성을 부여하는 수밖에! 다급했던 저는 아빠에게 어느 날 거짓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회사에서 가족과 함께 달리고 인증을 해야 하는 캠페인을 진행하는데, 같이 달릴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집에는 아빠밖에 없으니 저와 같이 딱 3km만 달리자고. 일종의 책임감,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안겨드린 셈이죠. ‘하얀 거짓말’이랄까요? 어찌됐든 더 늦기 전에 아빠가 하루빨리 달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일단 딱 한 번만 달리면 계속해서 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저의 제안에 아빠는 한참을 침묵하셨지만 그렇다고 딱히 부정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빠의 ‘부정하지 않음’이 곧 ‘긍정’이라는 것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약속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ABC마트에서 미리 구입한 255m의 아식스 러닝화를 아빠에게 건네드렸습니다. ‘딸을 위해서 무조건 뛰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아빠는 저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함께 달렸습니다. 만보기 앱을 켜고 집 앞 강변을. 미리 앞서 달려가 사진을 찍는 저를 의식하셨는지 아빠는 처음부터 무척 빠르게 달렸습니다. 그 모습이 조금은 ‘러너’ 같아서 저도 모르게 ‘아빠 러너 같다!’ 하고 크게 외쳤습니다. 그 소리가 싫지 않으셨는지 아빠는 더 빠르게 무리하며 달렸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며 쌕쌕거리더니 멈춰버리셨습니다. 800m 지점이었습니다. 초보 러너를 3km 연속해 달리게 하려 했다니. 아빠의 표정을 보는 순간 무리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바꿨습니다. 800m까지 뛰었으니 800m는 걷고, 다시 800m를 뛰자고. 1.6km, ‘1mile 달리기’로. 마침 다리 아래였습니다. 집에서 목적한 곳까지 두 개의 다리가 있는데, 첫 번째 다리인 이 다리까지 달렸으니 두 번째 다리까지는 걷고, 그 다리에서 되돌아 다시 첫 번째 다리까지 달리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집까지 걸어가자고. 800m의 여유를 얻은 아빠는 그사이 바쁘게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800m에 다다르자 방향을 바꿔 다시 힘차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속도는 처음보다 훨씬 느려졌고 자세도 엉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사이 저는 왠지 아빠가 ‘달리기의 즐거움’을 알게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을 벗어나 800m를 달리고, 800m를 걷고, 되돌아 800m를 달리고, 800m를 걸어 휘청휘청 집으로 되돌아오는 이 짧고 고된 여정이 앞으로 아빠에게 좀 더 나은 인생을 사는 듯한 기분을 주기를 바랐습니다. 이날의 달리기가 어땠는지 궁금했지만 바로 여쭙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아빠에게 ‘뭐하시냐’고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1시간 뒤 도착한 답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아빠 달리고 왔어!’

이것이 지난 1월의 일입니다. 그리고 어느 해보다 무덥게만 여겨지는 여름의 한복판을 건너고 있는데도 아빠는 멈추지 않고 매일 새벽 5시가 되면 해와 함께 일어나 여전히 달립니다. 1.6km에서 시작해 2km, 3km, 이제는 하루 4km 넘게 달립니다. 물론 한 번에 모든 거리를 달리지는 않아요. 이를테면 2km 뛰고, 조금 걸으며 숨을 돌리고, 다시 2km 뛰는 식으로 나눠 달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거리가 아니니까요. 일단 이불 밖을 나와, 러닝화를 신고, 집을 나선다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하루 4km 가까이 늘어난 자신의 달리기에 대해 아빠는 ‘십 리 달리기’라고 명명해 부르십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달리냐’는 물음에 아빠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루 십 리씩 달리지 않으면 내 인생이 망할 것 같다’고. 구체적으로는 달리고 나면 몸도 기분도 개운하고, 그리고 어쩌면 ‘총각 시절 몸무게’를 되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코로나19 시대가 과거의 기억이 되고, 내년 봄에는 꼭 아빠와 ‘힐링 마라톤’ 대회에 출전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제가 이 지면을 통해 아빠의 ‘십 리 달리기’ 이야기를 구구절절 늘어놓는 이유는 이 글을 읽는 누구라도, 일평생 달린 적 없는 누구라도, 마음만 있다면 달릴 수 있다는 증언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일단 나가서 800m, 아니 100m만 뛰어보세요, 그럼 알게 되실 거예요.
<이 기사는 브라보 마이 라이프(BRAVO My Life) 2021년 8월호(VOL.80)에 게재됐습니다.>







![[브라보 Pick] 시니어의 픽 ‘중동 리스크·혈압 관리·봄나물’](https://img.etoday.co.kr/crop/345/230/2302154.jpg)
![[Trend&bravo] 은퇴 후 문화 산책, 올해 문 여는 신상 미술관 4](https://img.etoday.co.kr/crop/345/230/2300724.jpg)

![[카드뉴스] 봄을 알리는 3월 전국 축제 리스트 9](https://img.etoday.co.kr/crop/345/230/2299200.jpg)
![[카드뉴스] '70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 무상 지원 혜택 정리](https://img.etoday.co.kr/crop/345/230/2300717.jpg)

![[요즘말 사전] “디토합니다” 뜻, 알고 보니 추억의 단어였다](https://img.etoday.co.kr/crop/345/230/2299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