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국 중 경제나 안보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춘 백제가 제일 먼저 멸망했다. 소정방(蘇定方)이 이끈 당군이 덕물도에 도착한 것이 660년 6월 21일, 당군이 전투를 시작한 것이 7월 10일, 그 하루 전인 9일 황산벌 전투가 있었고, 12일 부여성이 포위되며, 13일 의자왕이 공주성으로 탈출하지만 18일 항복한다.
당군이 백마강에 나타나서 사비성을 에워싼 지 6일 만에, 신라와의 황산벌 전투 후 9일 만에 백제는 사라진 것이다. 한 달이 안 된다. 8월 2일 백제 왕궁에서 열린 승리 축하연에서 단 아래 앉은 의자왕은 단상의 김춘추와 나-당 장수들에게 술을 치는 모욕을 당하고 곧 당나라로 끌려간다.
신라군은 백제인들을 어루만지면서 따뜻하게 대하지 않았다. 무열왕과 아들 법민(후일 문무왕) 등 신라의 최고위층 조차 딸과 누이를 (642년 대야성 전투에서) 잃었다는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도층이 이러니 승리감에 도취한 일반 군졸들은 닥치는 대로 부수고 학살하여 쓰러진 시체가 풀더미같이 쌓였다.
당은 백제 처리에 대해 명확한 로드맵이 없었던 것 같다. 고구려 공격을 위한 후방 기지가 제일 목표였지만 백제 지역 평정을 위해 백제를 부활시켜 신라의 부용국(속국)으로 존속시키거나 신라와 대등한 지위로 만들려 했다. 당은 663년 의자왕의 아들인 부여융(扶餘隆)을 당에서 데려와 웅진도독과 백제군공으로 임명하고 문무왕과 동격으로 백마의 피를 머금는 맹약을 맺게 한다. 부여융은 문무왕이 태자 시절 백제의 항복을 받으면서 말 아래 꿇려앉혀 침을 뱉으면서 모욕을 준 인물이다.
이 모든 상황이 백제 부흥운동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었다. 백제인들은 왕조의 멸망이 ‘한순간의 실수’로 일어난 것일 뿐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고 믿었다. 신라와의 전쟁은 항상 있어왔던 일이다. 서양에서 가장 비겁한 행위로 간주되는 ‘뒤에서 등을 찔린 것(die Dolchstoß Legende)’과 같이, 얼떨결에 뒤통수를 맞고 정신을 잃었는데 깨어보니 전에는 빌빌거리던 놈들이 집을 차지하고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이제 정신을 차려 한번 진검승부를 해보자고 나선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백제의 부흥운동이 우리의 역사에서 실패한 에피소드나 소극(笑劇)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주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인 것이다.
부흥운동은 멸망 직후 곧 시작된다. 부흥군은 오늘날 대전 유성구와 무주 일대에 진을 치고 당군과 신라군을 공격한다. 무주는 부여-웅진을 잇는 수도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이다. 8월 26일 나-당 점령군은 예산의 부흥군을 공격하지만 이기지 못했다. 반대로 부흥군이 9월 23일 사비성에 있던 동료들을 탈취하고 부여 남령(금성산)에 올라 보란 듯이 영채[木柵]를 세우고 사비성을 공격하자 20여개 성이 호응한다. 신라는 10월에 무열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반격에 나선다. 부흥군이 사비성을 공격하자 다음해 661년 2월 황산벌에서 전사한 관창(官昌)의 아버지 김품일(金品日)이 지휘하는 대규모 군대를 파견하여 구원하지만 백제군의 기습으로 물러난다.
그러나 백제 부흥운동은 실패했다. 전략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보자. 부흥운동이 왕조의 부흥을 목표로 삼았다면 의자왕을 계승할 왕을 세우고 흩어진 부대들을 중앙의 지휘 아래 흡수하며 수도 사비성을 탈취하고 가능하면 많은 성들을 흡수하여 세력을 키우는 등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야 할 것이다.

초기에는 일본에서 돌아온 의자왕의 아들 부여풍(扶餘豊 )과 장군 부여복신(扶餘福信), 승려 도침(道琛) 등이 이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많은 부흥군 부대가 백제의 부활을 확신한 듯 부여풍의 지휘 아래 들어왔다. 그러나 661년 3월 부흥군이 사비성을 포위 공격하면서 신라군과 벌인 웅진강 어귀 전투에서 1만 명의 전사자를 남긴 채 임존성으로 퇴각한다. 신라군 역시 군량이 떨어져 물러난다.
무승부로 끝난 것 같은 이 전투에서 병력 보충이 어려운 부흥군은 치명적 손실을 입으며 이것이 부흥운동의 전환점이 된다. 마치 1908년 의병 부대들이 서울 30리까지 진격했으나 일본군의 반격으로 패퇴한 후 의병의 기세가 꺾인 것과 비슷하다.
의자왕을 계승하는 왕을 세우는 문제는 그의 아들인 부여풍을 영입함으로써 순조로이 해결된 것같이 보이지만 함정이 있다. ‘일본서기’는 661년 8월 ‘복신이 (부여풍을) 마중 나와 절하고 국정을 위임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실력자가 명목상의 군주를 맞이한 것이었다.
각지의 부흥군들은 통합되지 못하고 ‘독립 왕국’으로 존속했으며, 도침이나 복신은 스스로 ‘장군’이라고 칭했다. 이들은 당의 사자에게 거만한 자세로 “등급이 낮아 일국의 대장인 나의 상대가 아니다”라면서 답장도 없이 돌려보낸다. 군사적 대치상황을 외교를 통해 풀어가면서 백제 부흥이라는 최종 목표로 나아가는 안목이 부족했던 것이다. 도침은 백제가 이미 회생한 것같이 ‘일국’의 대장이라고 거드름을 피우지만 험준한 주류성에 처박혀 만족하는 집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당군은 후방을 평정하면서 지구전으로 이들을 옥죄는 전술을 택한다.
부흥군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한 것은 내분이었다. 부여복신과 도침이 서로 경계하는 가운데 부여풍은 조정자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양측의 갈등은 서로 상대방을 제거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인식될 정도로 커졌다. 먼저 도침이 당한다. 부여풍도 복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제의(祭儀)나 주관할 뿐 실권을 가지지 못한 존재로 전락하자 불만이 증폭된다. 복신이 병을 핑계로 부여풍을 유인하자 부여풍이 선수를 쳐서 그를 제거한다. 부흥운동의 중앙을 지휘하던 3명 중 2명이 사라진 것이다. 이 현상이 권력집중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긍정적으로 평가하겠지만, 부흥군의 분열을 가속화함으로써 부흥운동은 더욱 약화된다.
663년 초 주요 거점에서 저항하던 부흥군이 항복함으로써 백제의 전선은 급속도로 무너진다. 뒤늦게 8월 백제 부흥을 위해 일본 지원군이 금강하구 백강구 전투에서 나-당 연합군과 싸우지만 패배한다. 일본 지원군은 또 다른 이야기이지만 부흥운동이라는 관점에서는 안티 클라이맥스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 구대열 이화여대 명예교수
서울대 영문과 졸, 한국일보사 기자, 런던정경대 석ㆍ박사(외교사 전공).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통일학연구원장 등 역임. 저서<삼국통일의 정치학><한국 국제관계사 연구> 등.




![[Trend&Bravo] 요양원? 실버타운? 시니어 주택 비교 5](https://img.etoday.co.kr/crop/345/230/2302180.jpg)

![[브라보★튜브] 서현철·정재은, AI를 이긴 부부 티키타카](https://img.etoday.co.kr/crop/345/230/2301356.jpg)

![[카드뉴스] '70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 무상 지원 혜택 정리](https://img.etoday.co.kr/crop/345/230/2300717.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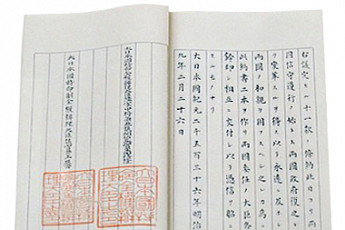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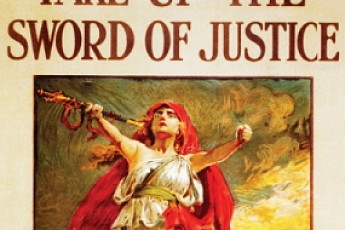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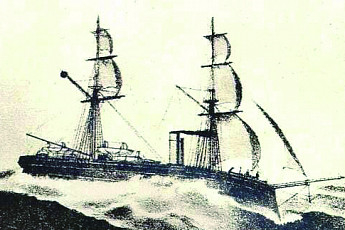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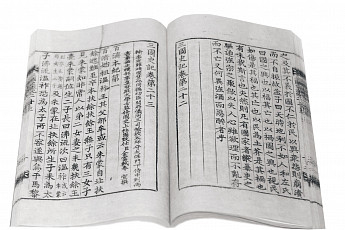

![[Trend&bravo] 은퇴 후 문화 산책, 올해 문 여는 신상 미술관 4](https://img.etoday.co.kr/crop/345/230/2300724.jpg)
![[요즘말 사전] “디토합니다” 뜻, 알고 보니 추억의 단어였다](https://img.etoday.co.kr/crop/345/230/2299807.jpg)
![[카드뉴스] 봄을 알리는 3월 전국 축제 리스트 9](https://img.etoday.co.kr/crop/345/230/2299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