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시장에 정작 사진보다 말만 가득한 상황이 벌어졌다. 사진들은 여느 전시장처럼 벽면에 걸려 있는데 관람객들이 그 사진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비가 많이 내리는 전시회 넷째 날, 한 무리의 사람들이 어수선하게 안내를 받으며 전시실로 들어왔다. 그들이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은 금방 알 수 있었다. 그들과 그들을 안내한 도우미들의 두런거림과 기존 관람객들의 주춤거림이 있었다. 돌발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되며 나는 그들과 마주했다.
한 시각장애인이 내 옆에서 전시된 사진 프레임을 한 손으로 더듬자 안내인이 그의 손을 저지했다. 나는 저지당한 장애인의 손을 이끌어 사진프레임과 그 사이의 사진을 만져보게 했다. 다시 옆에 전시된 다른 프레임을 만져 서로 간의 거리를 짐작하도록 도와주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던 안내인이 나와 눈이 마주치자 비로소 미소를 지었다.
그들이 무리지어 서 있는 곳은 ‘밤하늘도 파랗다’는 제목의 연작 세 점 앞이었다. 시각장애인을 안내하는 한 도우미가 엉뚱한 곳을 향해 서 있는 장애인을 돌려세워 전시 작품들과 마주보게 해주었다. 긴장감이 감돌았다. 전시장은 밖에서 내리는 빗소리가 느껴질 만큼 조용했고 작품을 강조하는 스포트라이트가 더욱 밝게 느껴졌다. 그 사이 큰숨을 몇 번 내쉬며 나도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혔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다, 처음 카메라로 밤하늘을 담기 위해 노출을 맞춰볼 때가 생각났다. 나는 당시, 그들처럼 주위가 가름되지 않는 밤하늘 아래 서 있었다. 깜깜한 밤하늘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마치 점자를 하나씩 손끝으로 헤아려 글로 읽어내듯 별이 하나씩 드러난다. 별들을 그렇게 점자의 점끼리 연결시키듯 한 단어가 만들어지고 이어 나름 한 문장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우리는 전시장 가득 별들을 채워나갔다. 그러면서 별과 별 사이 아무것도 없던 빈 공간에 차츰 차오르는 어렴풋한 빛의 아우라를 서로의 심상(心像)에 그릴 수 있었다.
이어지는 몽골과 유대 광야에서 촬영한 ‘빈자리의 아름다움’ 17점은 그들이 올 줄 미리 알고 준비한 작품들 같았다. 작품의 선별이나 순서 모두 그들을 위한 기획이나 다름없었다. 사진이 관람객의 생각을 이끌되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사진가로서의 막연한 바람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경험은 다시 만나기 힘든 축복이었고 누구라도 부러워할 행운이었다.
뒤늦게 전시장에 들어온 스태프들은 갑자기 벌어진 특별한 상황을 알아차리고 어쩔 수 없는 긴장감으로 조용히 뒤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다. 누구도 이들의 보지 못하는 눈을 무시하지 않았다. 이 전시를 기획한 스태프들도 예기치 않았던 이들의 방문에 감동하였다. 우리들은 이론과 말로만 바라던 ‘관람객들과 작가가 함께 작품의 질을 높이는 현장’을 체험하고 있었다. 마지막 작품을 셀프 도슨트로서 안내하며 ‘보는 자가 보지 못하는 세상을 보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볼 수 있는 세상’을 이야기했다.?
육체적으로 건강한 시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두운 곳에 있을 때 하늘빛을 향한 창을 찾거나 새로 만들어야 했지만, 이번에 방문한 시각장애인들은 어느 곳이든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모든 곳으로 통하는 열린 창이었다. 그들은 보고 생각하는 면에서, 볼 수 있는 자보다 자유로웠다.
한 시간 가까이 작품을 설명하느라 땀이 흘렀다. 작품 설명과 안내가 끝나자 시각장애인들이 돌아가며 내 손을 잡고 감사를 표했다. 팔을 크게 벌려 안아준 이도 있었다. 그때 뒤에서 지켜보던 관람객들의 박수 소리가 들렸다. 어떻게 될지 몰라 긴장감이 가득했던 시각장애인들을 안내한 분들이 보내는 따듯한 눈인사에 답할 수도 있었다.
전시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 작가가 있겠느냐마는, 전시를 마치면 마음 저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아쉽고 후회되는 마음은 남는다. 사진은 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 사진가가 셔터를 누르면 적어도 두 장의 사진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한 장은 필름 위에, 또 한 장은 심상 위에. 그 두 사진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이 사진가이다. 전시회에서는 그 갈등의 간극이 극적으로 드러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시각장애인들의 방문을 통해 바로 그 간극을 한껏 줄일 수 있었다. 사진 없는 사진전도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전시장에 걸어놓은 사진을 보여주지 않고 작가의 심상에 찍힌 사진으로만 전시회를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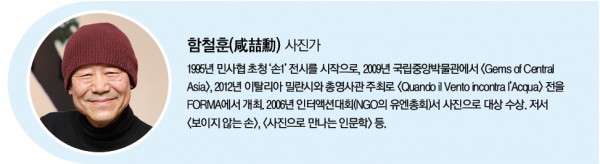



![[카드뉴스] 봄을 알리는 3월 전국 축제 리스트 9](https://img.etoday.co.kr/crop/345/230/2299200.jpg)






![[브라보★튜브] 오연수, 평양냉면 같은 영상 일기](https://img.etoday.co.kr/crop/345/230/2297703.jpg)

![[Trend&bravo] '봄동 비빔밥'이 이끈 봄 제철 채소 5선](https://img.etoday.co.kr/crop/345/230/229920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