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두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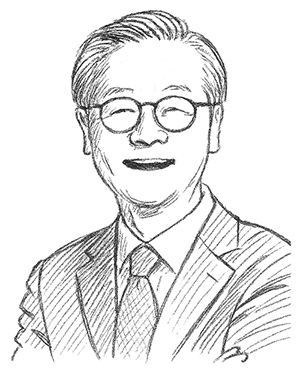
숫자 가운데 ‘1’은 특별하다. 다른 숫자들이 굽거나 돌며 유연한 선을 그릴 때, ‘1’은 오로지 위에서 아래로 곧게 선다. 구부러짐도, 장식도 없다. 그 단정한 직선은 시작을 상징한다. ‘11’은 그런 ‘1’이 나란히 선 모습이다. 두 개의 시작이 당당하게 마주한 형상, 그래서 흔히 11월을 ‘다시 시작하는 달’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거리를 스치는 바람은 차갑고, 흩날리는 낙엽은 쓸쓸한 노래를 낸다. 해는 짧아지고, 햇살은 낮게 깔린다. 그러나 앙상한 가지 끝에는 이미 새싹의 약속이 숨어 있다. 겉은 비었으되, 속은 봄을 준비한다. 선인들이 11월을 ‘비움의 달이자 채움의 달’이라 본 이유다.
농경의 시대, 11월의 들판은 텅 비어 있었다. 곡식은 거두었지만, 그 자리는 허무가 아니라 안도의 자리였다. 사람들은 그 빈자리를 채울 내년을 준비했다. 씨앗을 항아리에 담고, 도구를 손질했다. 선비는 서책을 다시 읽고 글씨를 다듬었다. 몸은 쉬었지만 마음은 일했다. 비움이 채움으로 향하는 첫걸음임을 그들은 알았다.
오늘의 노년에게도 11월은 비슷한 얼굴로 다가온다. 일상의 속도를 늦추고, 마음의 묵은 때를 털어내는 시간이다. 외로움이 스며들기 쉬운 계절이지만, 바로 이때가 삶을 가장 깊이 돌아볼 수 있는 때다. 낙엽이 흙으로 돌아가듯, 지나온 세월을 천천히 되짚는다. 그 안에서 배움의 흔적과 사랑의 결을 찾아낸다. 그것이 성찰이다. 성찰이 과거를 정리하는 일이라면, 준비는 내일을 향한 약속이다. 거창할 필요는 없다. 매일의 건강을 챙기고, 가족과 대화를 나누며, 작게라도 봉사하고, 책과 음악으로 마음을 일으키는 것. 그런 일상의 결심이 내일의 삶을 밝힌다. 영화 한 편의 여운, 손주의 웃음소리, 합창의 울림 하나가 긴 겨울밤의 등불이 된다.
비움의 계절이라 해서 결핍만 있는 건 아니다. 서리 내린 들판처럼 텅 비어 보이지만, 그 속은 생명을 품은 흙으로 충만하다. 노년의 11월도 그렇다. 세월의 주름은 쇠락이 아니라 경험의 지도다. 그 위에 피어나는 지혜는 인생의 결실이다. 가족과 사회를 향한 따뜻한 손길 하나가 새로운 시작의 씨앗이 된다.
두 개의 ‘1’이 나란히 선 숫자 11처럼, 과거와 미래가 이달 안에서 나란히 선다. 한쪽은 비워내고 한쪽은 채워간다. 삶의 흐름 속에서 11월은 멈춤이 아니라 전환이다. 낙엽 사이로 스며드는 빛처럼 노년의 11월은 조용히, 그러나 깊게 빛난다. 삶을 닫는 달이 아니라 다시 여는 달이다. 결국 11월은 비움과 채움, 성찰과 준비의 달이며, 인생이 가장 아름답게 익어가는 시간이다.










![[Trend&bravo] 은퇴 후 문화 산책, 올해 문 여는 신상 미술관 4](https://img.etoday.co.kr/crop/345/230/2300724.jpg)

![[카드뉴스] 봄을 알리는 3월 전국 축제 리스트 9](https://img.etoday.co.kr/crop/345/230/2299200.jpg)
![[카드뉴스] '70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 무상 지원 혜택 정리](https://img.etoday.co.kr/crop/345/230/230071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