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사와 함께하는 북인북] 번역에도 ‘소비기한’ 있어… 시대 감수성 담아야
어니스트 헤밍웨이, F. 스콧 피츠제럴드 등의 미국 고전을 즐겨 읽던 사람이라면 김욱동이라는 ‘옮긴이’가 익숙할지도 모른다. 그는 ‘노인과 바다’, ‘위대한 개츠비’, ‘허클베리 핀의 모험’, ‘주홍 글자’ 등 민음사 세계문학전집 시리즈를 비롯해 ‘앵무새 죽이기’, ‘그리스인 조르바’ 등 대표적인 영·미 문학 작품을 다수 번역했다. 2013년 은퇴 후에도 번역가이자 영문학자로서 번역서와 문학 연구서를 출간해온 그는 신간 ‘번역가의 길’을 통해 번역 이론의 지평을 또 한 번 넓히고 있다.

진짜 사람처럼 맥락을 이해하고 대화한다는 인공지능(AI) 서비스 ‘챗GPT’가 영어로 쓰고, 인공지능 번역기 ‘파파고’가 한국어로 번역한 책이 최근 출간됐다. 삶을 행복하게 꾸리는 방법에 관한 자기계발서다. 집필, 번역, 교정·교열, 편집 과정을 거치는 데 걸린 시간은 약 30시간. 기획부터 출간까지 걸린 총 시간은 7일에 불과하다. AI 기술, 기계 번역이 산업을 넘어 사회 전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인지 가까운 미래에 사라질 직업으로 번역가가 빠지지 않고 포함된다.
“번역가는 정말 없어지고 말까요?”
원로 번역가인 김욱동 서강대 명예교수를 만나 물었다. 어쩌면 실례가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듯 어깨를 으쓱이더니 입을 뗐다. “기계 번역은 문법 구조가 복잡하거나 상황과 문맥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문장, 중의적 표현이나 문장, 신조어나 고유명사 같은 낱말을 번역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미묘한 감정을 다루는 문학 번역에서는 더더욱 사람을 능가할 수 없죠.”
김 교수는 기계 번역의 한계를 증명한 사례로 2017년 열린 인공지능 번역기와 인간 번역가들 간의 대결을 꼽았다. 구글, 파파고, 시스트란은 ‘The dog was rude to the blanket’(강아지가 담요에 실례를 했다)이라는 문장을 ‘강아지가 이불에 예의가 없었다’고 바꿨다. 번역의 맛을 제대로 살리지 못해 일어나는 결과다. “가령 구글로 ‘나 말리지 마’라는 문장을 영어 번역하면 어처구니없이 ‘Don´t dry me’가 나와요. 옷을 말리는 게 아닌데 말이에요. 고유명사는 이보다 더 심각해요. 경남 진주를 입력하면 ‘Gyeongnam Pearl’로 나오기도 해요. 바다의 보석 진주라니, 황당하죠.”

어떻게 번역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가 번역한 작품이 처음 활자로 찍혀 나온 것은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이다.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공부할 때 미국 소설가 맥스 슐먼의 단편소설 ‘사랑은 오류’를 번역해 교내 잡지에 실었다. 대학원을 졸업한 뒤 벤저민 프랭클린의 ‘자서전’에서 ‘호루라기’에 관한 일화를 번역해 당시 월간 교양 잡지 ‘샘터’에 싣기도 했다. 어린 시절 프랭클린이 호루라기를 실제 값보다 네 배나 비싸게 샀던 일을 회고하며 쓴 글이다. 이때까지도 그는 영문학자가 되려 했으나, 부실하게 중역한 작품을 새롭게 바꿔 한국 문학의 지평을 넓혀보고자 번역가의 길을 택했다.
이제는 번역계에서 이름난 김 교수지만, 번역을 하면 할수록 ‘번역’과 ‘반역’ 사이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단다. 정확한 의미 전달과 동시에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가독성까지 챙겨야 하기 때문이다. “완벽한 번역은 좀처럼 이룰 수 없는 드높은 이상일지 몰라도 번역가는 ‘차선’을 향해야 합니다. 번역가는 육지와 육지 사이에 가로놓인 강을 건너게 해주는 뱃사공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나룻배를 젓는 뱃사공이 없다면 한 육지에 머물 수밖에 없듯이 번역가가 없다면 한 나라의 문학은 민족 문학의 울타리에 갇혀 있게 되겠죠. 우리가 침묵하며 변방에 살지 않고 다른 나라들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며 사는 건 다름 아닌 번역의 힘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시대의 감수성을 옮기다
그는 번역에도 ‘소비기한’이 있다고 말한다. 번역은 세월의 풍화작용을 받기 때문에 적어도 10년에 한 번씩은 기존의 번역을 다시 점검하고 새롭게 바꿔야 한다는 의미다. 한 시대에 좋은 번역으로 평가받던 작품도 다른 시대에서는 그러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성별에 관한 번역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냥 ‘교사’, ‘검사’라고 하면 될 것을 굳이 ‘여교사’, ‘여검사’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죠. 과거에는 해당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 중 남성이 여성보다 월등히 많아 생겨난 단어라고 해도, 현재는 그 비율이 뒤집어져 ‘남교사’라는 말을 사용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도 ‘여교사’라는 말이 여전히 자연스레 쓰이는 걸 보면 그만큼 언어에 남성 중심주의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 알 수 있어요. 시대를 거듭할수록 독자의 감수성도 바뀌니, 번역가들도 능동적인 태도를 취해야죠.”
책은 독자에게 어떤 형태로든 흔적을 남긴다. 은퇴 후에도 김 교수는 독자에게 긍정적인 흔적을 남기고자 매일 개인 사무실에 나가 번역과 저술 작업을 하고 책을 읽는다.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운동도 거르지 않는다. 번역가는 낱말의 넓이를 키우고 깊이를 더해야 하며, 언어 감각의 흐름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해서다. “폭넓은 독서만큼 다양한 낱말을 익힐 방법은 없습니다. 대신 책의 내용을 무조건 수용하기보다 한 번쯤 저자의 의견을 의심하며 비판적 사고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 권이라도 천천히 내용을 음미하다 보면 깨닫는 것이 참 많죠. 지금까지 해온 만큼 앞으로도 오래 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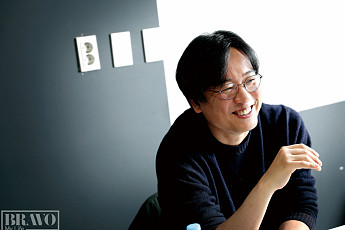




![[Trend&bravo] 은퇴 후 문화 산책, 올해 문 여는 신상 미술관 4](https://img.etoday.co.kr/crop/345/230/2300724.jpg)
![[요즘말 사전] “디토합니다” 뜻, 알고 보니 추억의 단어였다](https://img.etoday.co.kr/crop/345/230/2299807.jpg)
![[카드뉴스] 봄을 알리는 3월 전국 축제 리스트 9](https://img.etoday.co.kr/crop/345/230/2299200.jpg)
![[카드뉴스] '70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 무상 지원 혜택 정리](https://img.etoday.co.kr/crop/345/230/230071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