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사와 함께하는 북人북] '벌거벗은 미술관’ 통해 서양미술사 민낯 소개
‘미술 대중화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양정무(55) 교수는 서양미술사 연구자인 동시에 친절한 미술 안내자로서 출판과 강연, 방송 등을 통해 대중과 미술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 신간 ‘벌거벗은 미술관’을 통해서 서양미술사의 민낯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그를 만나 미술의 가치에 관해 얘기를 나눴다.

신간이 나올 때까지 8년이란 세월이 걸렸다. 이 책은 비평가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책 ‘난생 처음 한번 공부하는 미술 이야기’(이하 난처한) 시리즈와 같은 장기 프로젝트를 하면서 잠시 보류하다가 이제야 출간했다. 긴 레이스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 의미도 있지만, 비평가로서의 근육을 굳지 않게 하려고 썼다. ‘난처한’ 시리즈가 서양미술사의 길잡이라면, 이 책은 서양미술사의 민낯을 다룬다. 미술사로 본 미술의 가치, 박물관과 미술관의 역할, 초상화 속 무표정의 의미 등 늘 고민했던 질문에 대해 스스로 찾은 답을 책으로 풀어냈다. ‘난처한’ 시리즈에서 못 했던 얘기를 쿠키 영상처럼 이 책을 통해 전하고 싶었다.”
미술사를 다룰 때 사상, 시대, 공간 등으로 분류하여 설명하는 책이 많다. 하지만 이 책은 고전 미술, 표정, 박물관과 미술관, 팬데믹 같은 키워드를 통해 미술사를 조명한다.
“이 책이 미술을 이해하는 중요한 퍼즐 조각이 됐으면 좋겠다. 결정적인 조각을 맞출수록 퍼즐이 완성에 가까워지듯, 이 책이 미술에 다가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술관에서 볼 수 없는 흥미로운 미술사를 조명하되, 미술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예를 들어 근엄한 표정의 초상화는 당시 지배 세력의 엄중한 권위를 세우기 위한 수단이었고, 박물관은 해외에서 약탈한 보물을 보관한 수장고였다. 결국 미술은 화가의 고유한 개성으로 읽을 수 있지만, 더 넓은 시야로 보면 시대를 담는 그릇이다. 미술을 본다는 것은 시대를 읽는 동시에 줄기처럼 뻗어가는 역사를 읽는 일이다.”
일상을 깨는 상상력의 세계
그는 스스로 성덕(성공한 덕후)이라 불렀다. 그가 미술의 세계에 빠진 것은 어린 시절 우연히 본 백과사전의 삽화 때문이었다.
“우리 맘속엔 누구나 하나의 예술가가 살고 있다. 아이들을 보면 자신이 가진 날것의 느낌을 낙서로 보여준다. 나 역시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고, 백과사전의 삽화에 우연히 마음을 빼앗긴 이래 미술 덕후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왔다. 한마디로 하면 성덕이다. 미술과 역사를 좋아해서 미술사학자의 길을 가게 된 것도 있지만, 미술은 일상을 깨는 새로운 세계였다. 달나라를 동경하는 우주비행사의 느낌이라고 할까? 지금까지 내게 미술이란 우주는 새로운 지적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공간이었다.”
서양미술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유학을 위해 갔지만, 그에게 그곳은 천국이나 다름없었다.
“영국에서 유학할 때 학교 근처의 대영박물관(The British Museum)에 매일 등교 전에 한 번, 하교 후에 한 번은 무조건 들렀다. 집 가는 길에 있던 내셔널갤러리(The National Gallery)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들르는 필수 코스였다. 당시 주재원, 교수, 기자,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공부방을 운영했다. 같이 수업 겸 토론도 하고 박물관이나 소규모 미술관을 다니면서 다각도의 해설을 들려주는 역할을 맡았다. 인기가 나름 좋아서 한국에 못 돌아올 뻔했다.(웃음) 그 경험이 수업이나 강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
그의 삶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미술이듯, 미술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감염병’이란 키워드다. 팬데믹 이후 미술은 어떻게 변할까?
“중세 유럽에서 흑사병으로 대규모 인원이 죽자, 다양한 계층에서 미술을 통한 추모를 기획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미술의 대중화에 영향을 미쳤다. 팬데믹도 비슷하다. 코로나19 이후 미술에 대한 갈증이 더 커지면서, 미술관을 찾는 수요가 늘었다. 미술을 통한 심리적 위안과 치유의 힘이 다시 평가받고 있다. 이는 예술을 하는 사람의 태도를 더욱 진지하게 만들고, VR을 활용한 비대면 관람이 주된 체험으로 바뀔지도 모른다.”

미술은 비주얼의 언어
또한 비주얼 리터러시(Visual Literacy)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술은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그리는 장르다. 워낙 직관적인 영역이라, 그것을 언어로 풀면 어렵게 느껴진다. 가령 외국어는 알파벳, 맞춤법, 띄어쓰기 등 여러 가지를 익혀야 비로소 통달할 수 있다. 하나의 언어를 배우는 것은 하나의 세계에 더 다가가는 일이다. 미술도 그 과정은 어렵지만 보는 훈련을 잘한다면 이전과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린다. 잘 체득하면 시각적인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다. 결국 비주얼 리터러시를 통해 우리는 이미지를 읽을 수 있는 또 다른 눈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다.”
끝으로 그는 미술 입문자를 위한 조언과 더불어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전통과 역사에 관심 있는 시니어들이 미술사에도 관심이 많은데, 입문자가 미술을 즐기려면 한 발짝 떨어져 볼 줄 아는 여유도 필요하다. 특히 미술관의 이미지를 무겁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실 미술관만큼 카페나 문화시설이 잘 갖춰진 곳도 드물다. 미술을 감상하지 않아도 좋으니 미술관을 친숙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적으론 이제껏 배우고 익힌 바를 토대로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다. 기회가 된다면 ‘난처한’ 시리즈 번역본을 통해 이제껏 구축해온 관점을 서양인들에게도 들려주고 싶다.”
미술사학자로서 “미술을 통해 삶과 인간에 대해 조금씩 알아간다”라고 했다. 그는 명작의 위대함보다 미술에 담긴 고뇌와 고민, 좌절을 읽으면서 인간과 삶에 대해 배웠다. 결국 미술은 시대의 그늘을 읽는 일인지도 모른다. 좌절은 원동력이 되고, 어두운 그늘은 때론 위안의 공간이 된다. 미술 안내자인 그가 구축하는 미술의 그늘 속에서 더 많은 이들이 쉴 수 있기를 기대하며 마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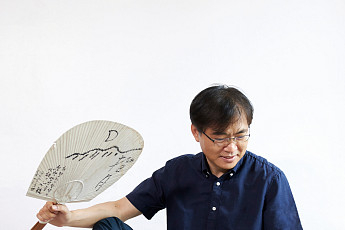





![[브라보★튜브] 오연수, 평양냉면 같은 영상 일기](https://img.etoday.co.kr/crop/345/230/2297703.jpg)
![[카드뉴스] 봄을 알리는 3월 전국 축제 리스트 9](https://img.etoday.co.kr/crop/345/230/2299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