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를 올린다고?
우리나라에서는 첫 번째 정규 홀 라운드를 할 때 “머리를 올린다”는 표현을 흔히 쓴다. 이 말이 언제부터 쓰이게 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많은 이가 이런 표현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주 쓰인다.
머리를 올린다는 말은 어릴 때부터 훈련받아온, 기생이 되려는 댕기머리 처녀가 한 남자에게 선택을 받아 밤을 보내고 쪽을 져 올리는 걸 의미한다. 머리를 올리고 나면 본격적으로 기녀생활을 하게 된다. 골프는 17~18세기 유럽 귀족 사회에서 즐기던 운동이다. ‘신사의 스포츠’라고도 불리는 운동인데 골프 첫 라운드를 하필이면 기녀의 첫날밤을 의미하는 말로 표현하다니 괴리감이 크다.

국내에 골프가 처음 소개된 건 1900년 고종 37년, 정부 세관관리였던 영국인들이 원산 바닷가에서 6홀의 코스를 만들어 하게 되면서부터라고 전해진다. 일반인들이 골프를 하게 된 건 이보다 한참 뒤인 1924년 경성골프구락부가 만들어지면서부터다. 우리나라 골프의 역사는 일제강점기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능동 서울어린이대공원 자리는 원래 1929년에 개장한 골프장 서울컨트리클럽이었다. 골프는 지금도 여전히 부자들의 스포츠로 인식된다. 일제강점기에 골프를 칠 수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그려보면 “머리를 올린다”는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 유추가 되면서 씁쓸해진다.

“첫 라운드 가자”
머리를 올린다는 표현은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된다. 좋게 생각하면 실전을 위한 준비가 그만큼 철저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실제로 골프 그린에 서기 전까지의 과정은 많은 노력을 요한다. 연습장에서 3~6개월 정도 기본기를 익히고 골프 매너도 따로 익혀야 한다. 요즘은 스크린 골프장에서 어느 정도 규칙을 습득한 후 필드에 나가는 사람이 많다.
곧바로 정규 홀에 가는 것보다는 실전 경험을 위해 9홀의 퍼블릭 골프장을 먼저 경험해보는 것도 좋다. 잔디의 감촉과 야외에서 골프를 칠 때의 감각 등 그린에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이 공을 칠 때 서 있어야 할 위치 등 그린에서 지켜야 할 에티켓을 알아야 서로 쾌적하게 공을 칠 수 있다. 골프는 단순히 채를 휘둘러 공을 홀컵에 넣는 운동이 아니다. 동반자를 배려하고 매너를 지키면서 즐기는 스포츠임을 인식해야 한다. 머리를 올린다는 표현으로 필드에 서기 위해 해온 노력을 깎아내릴 필요는 없다. 또 머리를 올려준다는 표현으로 우월감을 드러낼 필요도 없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담백하게 “첫 라운드에 가자”라고 표현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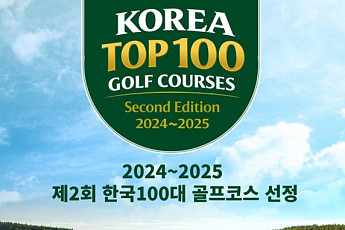



![[브라보★튜브] 오연수, 평양냉면 같은 영상 일기](https://img.etoday.co.kr/crop/345/230/2297703.jpg)
![[카드뉴스] 봄을 알리는 3월 전국 축제 리스트 9](https://img.etoday.co.kr/crop/345/230/2299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