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전엔 위아래 옷이 모두 헐렁한 것을 선호했다. 활동에 편함을 주어서였다. 나이가 들 대로 든 사람이 몸에 끼이는 옷을 입을 경우 보는 사람들이 점잖지 못하다고 여길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있었고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을 바꾸기 싫은 점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스타일에서 벗어났다. 자주 옷을 사지는 않아도 한마디로 젊은 티가 푹푹 나는 옷을 즐겨 입는다. 규율적 교복, 직장인 양복에서 진정한 패션으로 바뀌었다고나 할까. 혼사에 갈 때도 넥타이를 맨 정장을 고집하지 않는다. 주변 사람들은 자주 청년 같다고 말한다.
◇점잖은 옷을 고집했던 인생일막
필자의 패션(패션이라는 말을 쓰기 뭣한 구석이 없진 않지만)은 젊을 때부터 ‘‘젊음’과는 거리가 있었다. 우선 옷이 우장 같이 커 펑퍼짐한 것을 입었다. 활동에 더 편한 옷을 선택한 결과다. 색감도 칙칙한 걸 좋아했다. 특히 검은색을 좋아했다. 그래서 필자가 입은 꼬락서니를 보면서 사람들이 우울해 할 정도였다. 그런데 시니어가 되면서 젊고 멋스러운 옷에 자꾸 눈이 갔다. 아마 오래된 펑퍼짐함과 칙칙함에 대한 싫증 때문이 아니었나 싶다. 하지만 ‘시니어’라는 존재적 본질 때문에 스스로 이런저런 한계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계속 노티 풀풀 나게 입고 다녔다. 그리고 그게 무엇보다 익숙하고 편했다.
◇의류업계에 취업한 아들에게 옷가지 선사 받고선…
큰아들이 부산에 본사를 둔 의류업체에 취업했다. 간혹 필자에게 옷가지를 선물이라며 주었는데 모두 그 회사의 최신 패션 브랜드였다. 받은 옷이니 버릴 수도 없어 할 수 없이 꽉 끼고 색깔이 튀는 옷을 입게 되었다. 처음 입을 땐 엉덩이가 끼어 못 입겠더니 자꾸 입으니 생각보다 편했다. 필자는 사진작가여서 야외활동을 많이 하는데 이제는 야외에서 입어도 별로 불편하지 않다. 색깔도 처음엔 다른 사람 보기에 민망했지만 이 역시 익숙해지니 괜찮았다. 옷도 술과 마찬가지로 중독이다. 아들 회사 브랜드를 자꾸 걸치니 이제는 종전의 스타일인 펑퍼짐하고 칙칙한 바지는 오히려 이상한 느낌이 든다.
신발도 예전의 직장인 티 풀풀 나는 스타일에서 신세대 형태로 바뀌었다. 양말 역시 목이 짧은 것을 신는다. 예전에는 양말과 구두를 옷장과 신발장 제일 위에 있는 거부터 신었는데 이젠 바지 색깔에 따라 변화를 주기도 한다. 더구나 반가운 것은 이런 차림으로 나서면 실제 나이(67세)로 보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때로 10살 어리게 나이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물론 다른 사람 얘기 다 믿을 순 없지만.
남들의 시선도 시선이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젊게 옷을 입다 보니 마음과 행동도 젊어진다는 것이다. 또 젊은 감각의 옷은 이웃에게 즐거움을 준다. 불교에서 무재칠시(無財七施ㆍ돈 없이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일곱 가지 보시)를 중요하게 여기듯 필자의 경쾌한 스타일이 이웃의 눈에 즐거움을 주면 그 자체로 공덕 아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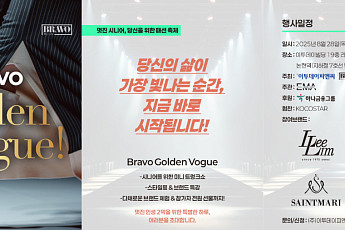

![[브라보★튜브] 오연수, 평양냉면 같은 영상 일기](https://img.etoday.co.kr/crop/345/230/2297703.jpg)

![[카드뉴스] 봄을 알리는 3월 전국 축제 리스트 9](https://img.etoday.co.kr/crop/345/230/2299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