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 사진을 공부하는 이들과 빼놓지 않고 촬영해온 풍광 중 하나가 밤하늘이다. 밤하늘을 촬영하러 나가기 전에 나누는 얘기가 있다.
“밤하늘이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나요?”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밤에 사진 촬영을 나간다는 생각은 안 해봤죠. 보이는 게 없는데 뭘 담을 수 있겠어요?”
맨눈으로 보면 밤하늘은 확실히 깜깜하다. 그런데 정말 깜깜하기만 할까? 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며 보는 것의 정확함을 역설했지만, 사진을 하다 보니 이런 경우 내 눈이 본다는 것이 그리 믿을 게 못 된다. 사진작업을 해보면 밤하늘이 결코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깜깜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진기에 있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장치의 도움으로 우리의 맨눈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줄 뿐 아니라, 그 색까지 드러내주어 우리의 선입견을 바꾸고 생각을 넓혀주는 것이 사진으로 세상에 할 또 다른 하나의 얘기이다.
카메라와 우리의 눈은 어떤 색이라도 빛이 넘치면 흰색에 가깝게 색이 바래지고, 반대로 빛이 모자라면 어떤 색이라도 희박해지고 어두워져 검다고 느끼게 된다. 이런 원리를 통해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를 조작함으로써 필름이 감당할 수 있는 적당한 빛을 모으는 일이 노출 작업이다. 우리 눈에 어둡고 깜깜해 보이는 밤하늘도 조리개를 열고 셔터 스피드를 길게 하면서 빛을 모으면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풍광이 필름에 드러난다. 카메라를 통해 보기 전에는 결코 보이지 않던 세상이다. 우리 눈이 세상의 기준이 아닐 뿐 아니라, 볼 수 없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되는 순간이다. 무비보다 스틸이 더 빛에 자유롭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 눈에 깜깜하기만 한 밤하늘이 사진을 통해 드러났다. 사진에 나타난 밤하늘은 온통 신비한 빛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빨주노초파남보 일곱 색과 연결된 빛이 아니라, 조금의 이음새도 없이 섬세한 색의 퍼짐으로 만들어진 여러 색이 모인 또 다른 무지갯빛이다. 칠흑 같은 밤이 대체로 절망과 무서움을 상징한다면, 빛은 희망과 약속의 상징이다.
살다 보면 누구라도 밤하늘처럼 깜깜한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다. 절망이나 불확실성과 마주하면 우리는 그 순간 좌절하고 주저앉고 싶어진다. 하지만 사방이 전혀 보이지 않아 아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애써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 주위를 돌아볼 여유를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른다. 즉 내 눈에 보이는 현실,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는 확실한 절망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스틸사진으로도 얘기하고 싶다.
사람의 눈에는 어두워 분명히 캄캄하게 보이는 저 하늘의 빛을 내 머리 속에 모아서 찬찬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근거를 제공해 준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내 눈에 분명 깜깜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곳에서 촬영한 사진이 내겐 꽤 있다. 이 작업을 하면서 어둠 뒤에 숨겨진 무지갯빛을 우리 모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열어 주었다.
이런 밤하늘의 사진 역시 빛이 내게 준 선물이다. 나는 사진작업을 할 때마다 사진은 빛이 그린 그림이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는다. 필름이 캔버스(화폭)이고 셔터와 조리개가 붓인데 보통 우리가 아는 붓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이란 붓인 것이다. 그렇게 시간과 공간을 조절함으로써 필름에는 아주 다양한 그림이 나타난다. 빛의 양을 자신의 의도대로 잘 조절하는 것이 그림을 잘 그리는 첫 번째 방법이다. 그 다음에는 시간과 공간의 조합이다. 그것을 잘 활용하면 사람의 눈과 같은 것을 사진기도 보게 할 수 있지만, 사람이 의식하지 못하는 것까지 그려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사진기는 우리의 눈을 확장해주는 도구가 된다.
사진을 처음 배울 때는 사진기를 조작하고 마지막에 셔터를 누르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사진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고 사진기는 온전히 사람의 의도를 담아내는 장치라고 여겼다. 하지만 경험이 쌓이면서 그 생각이 착각이었음을 깨달았다. 내가 의도한 것 너머의 것이 사진에 담길 때가 있었다. 그때에도 사진은 빛에 숨겨진 다른 능력을 발휘해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던 세상을 보게 해준다. 까맣게만 보이는 밤하늘에 숨겨져 있던 색이 드러나는 것처럼, 거기에는 내가 의도하거나 조작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 비록 그 과정을 사람이 조작하더라도 그 결과물이 펼쳐내는 세상은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세계임을 경험하게 되었다. 사진가로서의 나의 시각은 그러한 맨눈으로 보아왔던 세계를 보기 전과 후로 구별된다. 내 안의 선입견이 쨍하고 깨지는 순간이다.
사진도 역시 내 생각을 깨뜨려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나를 바꾸어 주는 과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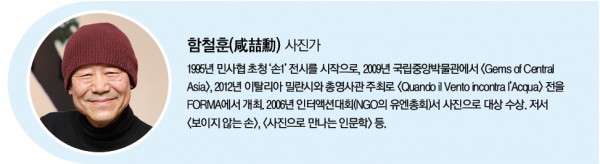




![[Trend&bravo] 은퇴 후 문화 산책, 올해 문 여는 신상 미술관 4](https://img.etoday.co.kr/crop/345/230/2300724.jpg)


![[카드뉴스] 봄을 알리는 3월 전국 축제 리스트 9](https://img.etoday.co.kr/crop/345/230/2299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