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 골퍼 김용준 칼럼]
독자는 어떤 그립을 잡고 있는가? 위크 그립? 뉴추럴 그립? 스트롱 그립? 나는 위크 그립을 잡는 플레이어를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백이면 백 뉴추럴 그립 아니면 스트롱 그립이다. 뉴추럴 그립을 잡는 플레이어에게 ‘왜 뉴추럴 그립을 택했냐’고 물으면 대부분 이렇게 답한다. 골프를 시작할 때 그립에는 세 종류가 있다(위크, 뉴추럴, 스트롱)고 듣고 깊게 따져보지 않은 채 뉴추럴 그립을 선택했다고. 이들에게 ‘왜 스트롱 그립을 잡지 않느냐’고 물으면 의외의 답을 듣는다. 바로 ‘스트롱’이라는 이름 탓에 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약하다는 뜻의 ‘위크’와 중립이란 뜻의 ‘뉴추럴’, 그리고 강하다는 뜻의 ‘스트롱’이 있다면 어떤 것을 고르겠는가? 셋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많은 사람은 가운데 것을 고른다. 같은 종류 물건인데 값이 싼 것과 비싼 것, 그리고 중간인 것이 있다면 십중팔구 중간 것을 고른다. 이 성향은 문화적 배경까지 더해져서 더 강해진다. 바로 중용(中庸) 때문이다. 논어 맹자 대학 중용 할 때 그 중용 말이다.

무슨 소리냐고? 어느 한 편으로 기울지 않는다는 중용을 큰 미덕으로 삼았던 탓에, 뭔가를 선택할 때 적당한 것을 고르는 것 아니냐는 말이다. 스트롱 그립을 쓰는 플레이어가 적은 것은 그 이름뿐 아니라 별명 탓도 있다. 스트롱 그립은 일명 ‘훅 그립’이라고도 부른다. 훅은 왼쪽으로(오른손잡이 골퍼인 경우) 감기는 것을 말한다. 처음 들을 때 볼이 왼쪽으로 감긴다면 선뜻 그 그립을 선택할 사람이 있겠는가? 나도 그랬다. 독학으로 골프를 시작하면서 별 생각 없이 뉴추럴 그립을 택했다. 어깨너머로 보며 익힐 때도 오랫동안 다른 그립으로 바꿔볼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숱한 시간을 슬라이스로 고생했다. 필드에서 제법 좋은 점수를 낼 수 있게 된 뒤에도 내 샷은 항상 슬라이스였다. 드라이버 샷은 비행접시처럼 휘었다. 흔히 슬라이스로 고생하는 골퍼에게 11시 방향을 보고 치라고 조언한다. 그런데 내 경우엔 11시 방향으로 쳐도 오른쪽으로 가끔 아웃 오브 바운드(OB)가 날 정도로 오른쪽으로 많이 휘었다. 그래서 나는 10시 방향을 보고 드라이버 샷을 치곤 했다. 아이언 샷도 마찬가지였다. 치기만 하면 오른쪽으로 밀렸다. 그런데 어떻게 점수를 내고 급기야 프로 골퍼까지 됐냐고? 바로 일관성 덕분이다. 내 샷은 아주 일관되게 오른쪽으로만 휘었다. 열심히 휘둘러댄 덕에 힘이 붙어서 거리가 제법 났다. 그러니 늘 목표보다 한참 왼쪽을 겨누고 치면 원하는 곳에 볼을 갖다놓을 수 있었다. 그러고 나선 내 샷은 페이드(살짝 오른쪽으로 휘는 샷)라고 자위하곤 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나는 지독한 슬라이스로 고전했다. 말이 좋아서 일관성이지, 오른쪽으로 크게 휘는 샷으로 좁은 홀에 서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겠는가?
내가 스트롱 그립 맛을 본 것은 프로 선발전을 통과하기 불과 얼마 전이었다. 하루는 당시 자주 겨루던 박창교(2014년 아난티클럽 챔피언) 선배에게 완패했다. 그날따라 박 챔프는 드라이버 샷을 반듯하게 날리면서 거리도 부쩍 멀리 보냈다. 당시 나보다 쇼트 게임이나 퍼팅 실력이 뛰어난 그였다. 그날은 비거리까지 나를 바싹 따라붙으니 당할 재간이 없었다. 라운드가 끝나고 식사를 하면서 박 챔프는 그립을 바꿔봤더니 효과가 너무 좋다고 비결을 털어놨다. 바로 스트롱 그립으로 바꿔 잡아봤다는 얘기였다. 그랬더니 슬라이스를 내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쓸 필요가 없더라는 것 아닌가? 그 뒤 나도 밑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스트롱 그립을 잡아봤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드라이버 샷 슬라이스가 크게 줄었다. 그만큼 비거리도 늘었고. 아는 만큼 본다고 하던가? 그 뒤로 TV 골프 중계를 보면 선수들 그립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이럴 수가! 스트롱 그립을 잡은 선수가 훨씬 많지 않은가? 왜 이걸 몰랐을까? 수년간 슬라이스로 말 못 할 고생을 한 것이 너무 억울했다. 그 뒤로 조금씩 스트롱 그립으로 고쳐가면서 적응했다. 그리고 지금은 스트롱 그립을 잡으라고 가르친다.

스트롱 그립을 어떻게 잡는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대부분 알 것이다. 셋업을 하고 위에서 내려다볼 때 왼손 손마디가 두 개나 두 개 반 정도 보이면 적당하다. 세 개까지 보이면 너무 과한 것이다.
칼럼 제목은 ‘클로즈드 그립을 잡아라’인데 클로즈드 그립이 뭔지 얘기를 안 하고 끝낼 뻔했다. 클로즈드 그립은 내가 지은 이름이다. 나는 스트롱 그립 대신 클로즈드 그립이라고 부른다. 클로즈드는 스트롱이라는 말이 주는 편견을 털어낸다. ‘클로즈드’(Closed)는 ‘닫았다’는 뜻이다. ‘열었다’는 뜻인 ‘오픈’(Opened)의 반대말이다. 나는 위크 그립은 오픈드 그립이라고 이름 지었다. 뉴추럴 그립은 그대로 뉴추럴이라고 부른다. 슬라이스로 애를 먹는다면 클로즈드 그립을 잡기를 권한다. 훅으로 고전하고 있다면 오픈드 그립을 잡으면 좋다. 클로즈드 그립이니 오픈드 그립이니 하는 것은 세계 최초로 뱁새 김용준 프로가 이름 붙인 것이라는 점도 널리 알려주기 바란다. 많은 경우에 이름이 실질을 지배한다. 골프에서 그립 이름도 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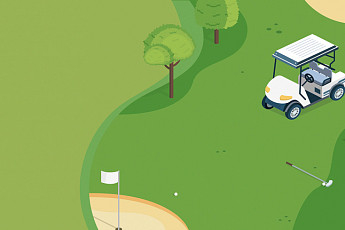



![[Trend&bravo] 은퇴 후 문화 산책, 올해 문 여는 신상 미술관 4](https://img.etoday.co.kr/crop/345/230/2300724.jpg)
![[카드뉴스] '70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 무상 지원 혜택 정리](https://img.etoday.co.kr/crop/345/230/2300717.jpg)
![[카드뉴스] 봄을 알리는 3월 전국 축제 리스트 9](https://img.etoday.co.kr/crop/345/230/2299200.jpg)

![[요즘말 사전] “디토합니다” 뜻, 알고 보니 추억의 단어였다](https://img.etoday.co.kr/crop/345/230/2299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