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그런 봄바람에 매력자산 돋아나고 PART3] 젊어 보이려 애쓰지 말자
엄마는 그 유명한(?) 58년 개띠다. 수많은 동년배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20대에는 결혼과 출산, 30대와 40대는 지난한 육아, 50대에는 고장 난 몸과 싸웠다. 그리고 지금 엄마의 나이 앞자리는 6을 바라보고 있다. 엄마는 수많은 58년 개띠처럼 형형색색의 아웃도어를 장례식장, 예식장 빼고 거의 모든 자리에 입고 나간다. 뒷모습만으로는 우리 엄마와 남의 엄마를 구분할 수 없는 헤어스타일과 패션. 그렇다고 엄마의 지금 패션에 대해 비난할 수는 없다. 엄마에게는 이름 석 자만큼이나 옅어져버린 ‘자신’. ‘패션은 자신을 표현하는 도구다’라는 말을 패션을 전공하며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듣고,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남들에게 말했다. 엄마의 이름 석 자와 엄마라는 육체와 정신을 쏙쏙 빼먹고 자란 나는 할 말이 없다. 지금은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다는 엄마에게 무작정, “엄마 그 오렌지색 점퍼는 정말 아니지 않아?”라고 말할 순 없다. 우리 엄마와 수많은 남의 엄마에게 패션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자신을 찾는 법에 관한 지도를 내밀어본다. 우선 이 지도의 가이드로 적당한 4명의 인물을 꼽아봤다.
<글> 김민정 프리랜서 패션에디터 h98008272@gmail.com
◇ 패션 디자이너 노라노 "인생 철학이 녹아 있는 옷을 입어라"

“옷을 잘 입은 사람은 옷보다는 그 사람이 기억나요.” 몇 해 전 <노라노>라는 영화가 개봉될 즈음 실제 주인공인 패션 디자이너 노라노를 인터뷰한 적이 있다. 노라노는 1947년 국내에서 출발한 두 번째 국제선 비행기를 타고 미국 유학을 간 신여성으로,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1956년 한국에서 제일 먼저 패션쇼를 열었으며, 기성복이란 제도를 프랑스보다 앞서 만들었다. 인터뷰를 했던 그때 이미 노라노는 80세를 훌쩍 넘긴 나이였다. 노라노는 심플한 디자인의 캘빈클라인 시계를 차고, 어깨선에 딱 맞는 벨벳 재킷을 입고 있었다. 단정한 커트 머리에 보라색 아이섀도를 바른 모습에서는 바지런함이 느껴졌다. 잘 입었다, 못 입었다가 아니라 참 노라노답다는 생각이 인터뷰 말미에 들었다. 인생을 일부러 ‘루틴’하게 만들었다는 노라노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혹시라도 더 일찍 깨면 5시가 될 때까지 누워 있는다) 45분간 스트레칭을 하고, 똑같은 식단의 아침밥을 먹는다. 그리고 동네 공원을 45분 걷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9시까지 출근한다. 퇴근은 당연히 6시, 칼 같이 맞춘다. “시계나 다름 없죠. 세상에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생활을 이렇게 루틴하게 만들어놓으면 쓸데 없는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죠.” 그녀의 철학은 패션에도 그대로 적용됐다. “스무 살부터 일을 했어요. 직장 여성으로 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생활이 단순해야 일에 집중할 수 있어요. 패션도, 생활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복잡하게 만들지 않아요.” 머리를 짧게 유지하는 것도, ‘시그니처 룩’이라고 불릴 만큼 똑같은 스타일로 옷을 입는 것도 모두 이런 패션철학 때문이다. 옷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보인다는 말에 노라노만큼 적당한 사례는 없다. 멋지게 입고, 트렌디하게 입는 것이 답이 아니다. 자신의 인생철학이 스타일에 녹아 있으면 그게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이다.
◇ 사업가 겸 스타일리스트 린다 로딘 차라리 ‘안티’ 안티에이징

“난 60대가 될 때까지 늙었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종종 젊은 사람들 위주로만 돌아가는 문화 때문에 힘들기도 해요.” 곧 일흔을 바라보는 린다 로딘은 여전히 주말이면 빈티지 시장을 돌아다니고, 종종 ‘중고장터’를 통해 자신의 옷과 탐나는 남의 옷을 교환해서 입는다. ‘패션은 여자들의 창의력을 강물과 같이 흐를 수 있게 도와주는 돌파구’라는 명제에 충실하다. 그래서 가끔 짧은 스커트에 타이츠를 신고(자신의 다리가 예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롤업 청바지를 애용한다. 부엉이처럼 큰 컬러 안경과 새빨간 립스틱도 즐긴다. 물론 한때 그녀도 하얗게 센 머리를 염색할까, 주름진 이마에 필러를 맞을까 고민했다. “하지만 필러를 맞고 마주한 제 얼굴은 제가 아니었어요. 대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할머니가 보일 뿐.” 그녀는 차라리 ‘안티’ 안티 에이징을 외쳤다. 젊어 보이는 것에 포커싱되는 중년의 패션을 거부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의외로 젊은이들만의 소유물인 줄 알았던 ‘신선함’을 그녀에게 돌려줬다. 유니클로의 생지 데님을 툭툭 걷어 입고, 바삭한 화이트 셔츠에 빨간 플랫 슈즈를 신은 린다 로딘의 패션에서는 나이라는 코드가 읽히지 않는다. 그저, 린다 로딘이라는 여자가 있을 뿐이다.
◇ 영국 총리 테리사 메이 그 시절, 내가 좋아했던 무언가를 기억하자

자신을 찾는 일에 불특정 다수, 즉 대중의 눈치를 보지 않았던 또 다른 정계 인물이 있다. 얼굴보다 구두로 첫 취임기사를 장식한 영국의 총리 테리사 메이. 그녀의 패션은 한마디로 멋지다. 20대 여자들의 트렌디함과 중년 여성의 묵직함, 워킹 우먼의 단호함이 한 벌에 담겨 있다. 한정판으로 출시된 구두를 사고(입술 모양이 그려진 앙증맞은 플랫슈즈다), 허벅지까지 올라오는 사이하이 부츠를 신는 과감한 여자다. “저는 늘 여성들에게 ‘고정관념에 맞추려 하지 말고, 당신 자신이 되라’고 말해요. 만일 당신 개성이 옷 또는 신발을 통해 보인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 바람에 테리사 메이의 연관 검색어에는 ‘슈즈 마니아’가 뜬다. 우리 엄마는 보라색을 좋아했고, 벨벳으로 만든 무언가에 항상 반했다. 하지만 언제나 손에 들린 건 물세탁이 가능한 실용적인 옷이었다. 테리사 메이에게는 구두 쇼핑이 취미활동이자, 스트레스를 푸는 창고이며,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를 찾는 놀이였다. 내가 좋아했던 그 시절의 무언가를 떠올리자. 엄마에게 보라색 벨벳 슈즈가 필요한 것처럼.
◇ IMF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 ‘나’에 관한 고정관념을 깨자

흰머리에 쇼트커트, 수영으로 다져진 다부진 어깨, 조금의 경사도 느껴지지 않는 빳빳한 허리. 당당함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리는 이 프랑스 여자는 IMF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다. 방탄 가공을 거쳤을 법한 그 단단한 사회의 유리천장을 뚫고 ‘최초’로 IMF 총재 자리에 앉았다. 줄곧 ‘남초’ 직장에서만 생활해온 그녀는 전쟁터 같은 직장생활에서 총을 잡기보다는 립스틱을 잡았다. 무채색의 팬츠 슈트로 넥타이맨들과 경쟁하는 대신 핑크색 스커트로 여자다움의 힘을 강조했다. “생각은 그만하고, 행동 좀 하시죠”라는 말을 자주 해 ‘아메리칸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행동파인 그녀 앞에서, “일이 힘들어서, 이게 편하니깐”이라는 말로 유니폼 같은 무채색 패션으로 직장생활을 하는 워킹 우먼들은 용납이 안 된다. 그녀는 수년간 IMF 총재 역할을 해오며 능력마저도 스타일리시하다는 사실을 증명해냈다. 여전히 스카프 쇼핑을 즐기고 핑크색 트위드 슈트를 입고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60대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그녀의 지금 룩은 뚝심 있게 지켜온 자기 자신 그 자체다.
>>김민정 프리랜서 패션에디터
남성지 <아레나 옴므 플러스>를 거쳐, <슈어>와 <그라치아>의 패션 에디터로 10여 년간 일했다.
지금은 프리랜서 에디터로 패션 관련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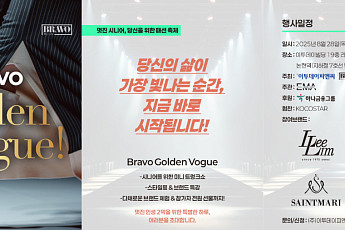

![[Trend&bravo] 은퇴 후 문화 산책, 올해 문 여는 신상 미술관 4](https://img.etoday.co.kr/crop/345/230/2300724.jpg)

![[카드뉴스] '70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 무상 지원 혜택 정리](https://img.etoday.co.kr/crop/345/230/2300717.jpg)
![[카드뉴스] 봄을 알리는 3월 전국 축제 리스트 9](https://img.etoday.co.kr/crop/345/230/2299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