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녀와 나는 걸을 때 보폭이 비슷하다. 빠르거나 더디지 않으니 산길에서도 조곤조곤 이야기를 나누며 걷는 편이다. 오랜만에 산에서 먹는 밥맛은 또 얼마나 좋을까? 쳐져있던 마음이 한껏 부풀어 들뜬 맘으로 집을 나선다.
불광역 2 번 출구에서 장미공원 방향으로 걷다보면 북한산 족두리봉으로 오르는 길이 나타난다. 그녀와 내가 좋아하는 코스다. 시작부터 가파른 만큼 재미도 있다. 맘이 통했는지 우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족두리봉으로 향했다. 사람의 손이 타지 않은 진분홍 꽃들이 길 양 쪽에 마주 서서 우리를 맞아주었다. 이 길에 진달래가 이렇게 많았나? 새삼 놀랍다. 겨울이 멈칫대는 사이 몰래 온 봄이 족두리봉과 연결된 좁은 오솔길 사이에서 노닐고 있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끝에 누런 흙먼지가 날린다. 중턱쯤 오르다 마스크를 벗었다. 때마침 능선을 타고 넘어오던 바람이 맑은 공기를 훅 몰아준다. 누구랄 것 없이 크게 숨을 들이킨다. "와아! 너무 좋다~" 산 중턱에서 마시는 공기는 집에서 마실 때와 확실히 다르다. 역시 나오길 잘했다.
공기가 맑아서인지 혹은 코로나19에서 벗어난 곳이라고 생각해선지 평일인데도 사람들이 많다. 족두리봉 너른 바위를 등지고 앉아 건물이 다닥다닥 붙은 마을을 내려다본다. 바짝 말라 건조한 하늘 아래 봉긋봉긋 솟은 아파트와 빌딩, 사이사이 납작납작 엎드린 다가구 주택들. 탁한 느낌인데 신기하게 하늘은 푸르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까이 다가갈수록.
산에서 먹는 밥은 유난히 맛있다. 후다닥 챙긴 밥과 조금씩 덜어내 온 반찬이 꿀맛이다. 높은 곳에서 세상을 마주하니 마음도 여유롭다. 사는 게 뭐라고 그리 아옹다옹 하냐고 즐겁게 살자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 꾹꾹 눌러 담은 밥그릇이 텅 비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워." 손질해온 딸기를 입에 넣던 그녀가 불쑥 말했다. 지난 연말 세상을 떠난 남편이 시간이 갈수록 그립다고. "그렇구나… 그렇겠지…." 친구로서 해줄 수 있는 게 그저 끄덕끄덕 고갯짓이라 슬프다.
족두리봉을 끼고돌아 향로봉으로 향했다. 진분홍 진달래와 노란 개나리가 나무 사이사이마다 만개했다. 사진을 찍어 확인해보니 수분이 모자라 꽃잎이 바짝 말랐다. '멀리선 아름답게만 보이더니 너도 애쓰는 중이었구나' 하긴, 사람도 그렇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한 걸음 가까이 들어가 보면 걱정과 근심이 있다. 사람이나 꽃이나 서로 적당한 거리에 있을 때 보기 좋다는 생각을 한다.
달콤한 행복을 떠올리다
습기라곤 없는 진달래꽃을 따서 입에 넣고 씹어본다. 텁텁한 꽃 향이 입안에 퍼진다. 기분이 좋다. 나란히 걷는 친구의 입에도 넣어준다. 몇 해 전, 혼자 배낭을 메고 산에 올랐다가 소나기를 만난 날은 아카시아 꽃을 따먹었다. 비를 피하느라 바위 아래 멈췄다 내려오는 길에 따먹었던 젖은 아카시아 꽃잎은 얼마나 달콤했던지. 그 후로 산에서 꽃을 보면 입안에 넣고 씹는 버릇이 생겼다. 지금처럼 먹어도 되는 진달래, 아카시아가 대부분이지만.
그녀의 수다가 줄었다. 진분홍 꽃잎을 오물오물 씹으며 무슨 생각을 할까? 문득 오늘 같은 날은 아카시아 꽃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씹을수록 달콤한 그 꽃. 아카시아 꽃을 씹으며 행복하던 그 느낌이 그립다. 그녀와 함께 오물오물 달콤한 행복을 씹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 다음엔 내가 먼저 전화를 해야지. 아카시아 꽃 필 무렵 산에 가자고 해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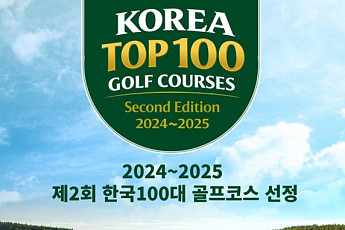

![[Trend&bravo] 은퇴 후 문화 산책, 올해 문 여는 신상 미술관 4](https://img.etoday.co.kr/crop/345/230/2300724.jpg)

![[카드뉴스] 봄을 알리는 3월 전국 축제 리스트 9](https://img.etoday.co.kr/crop/345/230/2299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