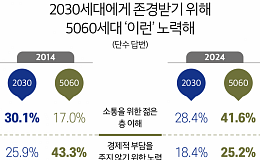“환자만큼 가족도 힘들어, 이들 모두 돕는 게 우리 일이죠”

“젊을 때부터 자원봉사에 관심을 갖고 장애인 운전봉사나 아동 입양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했었죠. 그러다 교통사고로 직장을 그만두고 쉬던 차에 호스피스 봉사자 교육에 대해 알게 돼 시작하게 됐어요.”
그녀는 자원봉사자들의 존재 이유를 한마디로 정리했다.
“긴 병에 효자 없다잖아요.”
환자 스스로도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가족들도 지친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을 돌보기 위해 자원봉사자가 활동한다는 것이다.
“자원봉사를 위해 미용도 배우고 발마사지도 따로 배웠어요. 여러 가지를 해드리면 환자도 좋아하지만 가족에게는 쉴 틈이 생겨요. 가족도 사람이라 지치면 창밖만 쳐다보고 무기력해져요. 환자도 가족이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아요. 가족 눈치를 보게 되죠. 이때 가족 간의 대화를 유도하거나 휴식을 갖도록 해주는 것도 저희의 역할이에요.”
호스피스 자원봉사가 평범한 사람들에겐 잘 알려지지 않은 분야이다 보니 초창기엔 고충도 많았다. 환자 가족으로부터 돈 때문에 하냐는 오해부터 “호스테스(접대부)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았다.
“한번은 호스피스 교육을 위해 작성한 유서를 식탁 위에 올려놨는데 중학교 2학년이던 딸아이가 보고 대성통곡을 한 적이 있어요. 덕분에 엄마의 자원봉사에 대해 잘 설명하는 계기가 됐죠. 지금은 남편이나 아이들 모두 제 역할을 자랑스러워해요.”
박 씨는 최근 환자를 한층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된 일을 겪었다. 유방암 판정을 받아 수술과 항암치료를 했기 때문이다.
“항암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힘든 기분을 이해하게 됐죠. 치료 후 식사할 땐 유리가루 섞은 모래밥을 먹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치료가 마무리될 때쯤 봉사활동을 해도 된다고 해서 다시 시작했죠. 봉사 과정에서 저 스스로도 위안받고 치료되는 기분이었어요. 실제로 치료 결과도 좋아 의료진이 놀랄 정도였죠.”
호스피스 봉사활동에서 만난 첫 번째 환자를 박 씨는 아직도 기억한다. 마지막 순간까지 남편에게 여자이고 싶어 했고, 사랑받고 싶어 했던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고 했다.
“아무래도 환자를 보내고 나면 마음이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기를 기다려요. 잊으려 하면 더 힘들거든요. 봉사라고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충격이 커서 힘들 땐 자원봉사자끼리 토닥이기도 하고 주저앉아 울어도 된다고 위로도 해요. 서로 큰 힘이 되죠. 병원에서 나이가 많아 밀어내기 전까지, 건강이 허락될 때까지 자원봉사를 계속하고 싶어요. 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싶으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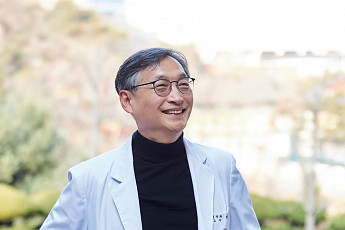




![[카드뉴스] 품위 있는 노후를 위한 7계명](https://img.etoday.co.kr/crop/345/230/2013021.jpg)

![[카드뉴스] 뇌졸중 전 뇌가 보내는 마지막 신호](https://img.etoday.co.kr/crop/345/230/201186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