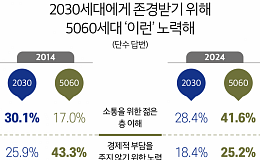[同年기자] 그 여자 그 남자의 물건, 추억을 소환하다

엄마는 요리솜씨가 좋지 않았다. 그러나 어린 시절에는 엄마의 요리가 최고인 줄 알았다. 주발에 담는 밥도 엄마만 세워서 담을 수 있고 세상의 맛이 엄마의 손끝에 다 있는 줄 알았다. 그 환상이 깨지기 시작한 것은 초등학교 고학년 때. 친구 엄마의 요리가 더 맛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다.
엄마는 천성이 부지런해서 늘 무언가를 열심히 만드셨다. 학구열이나 실험정신은 타고난 것 같았다. 자식들이 다 출가하고 혼자 사실 때도 온갖 것을 다 만드셨다. 엄마의 바느질 솜씨는 꼼꼼하고 질서정연했다. 늘 들릴까 말까 한 소리로 흥얼거리며 바느질을 하셨다. 손바느질로 하는 누비나 골무를 만들고 가끔은 조각 천에 수를 놓은 상보와 옷을 만드셨다. 밤늦도록 엄마의 손에 들려 있는 천이 아침에 일어나면 거의 모양새를 갖추어가고 있었다. 그것이 신기해 자꾸 쓰다듬어보던 기억이 난다. 어느 날, 장성한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엄마가 말씀하셨다.
“네가 올해 몇 살이니? 벌써 그렇게 나이를 먹었니? 그러니 내가 얼마나 늙었는지 알겠다.”
그날 엄마가 장롱 정리하는 것을 지켜봤다. 치마저고리를 곱게 접어 사이사이에 마분지를 끼우고 좀약을 넣었다. 손으로 짠 모시저고리와 치마가 고왔다. 비단치마, 함경도식 고쟁이, 올을 뺀 상보. 시집 올 때 가져온 수놓은 베갯잇. 장롱에는 엄마의 일생이 그대로 들어 있었다. 매년 빨고 햇볕에 말리고 곱게 접어 넣던, 그렇게 의식처럼 되풀이되곤 했던. 나는 엄마의 고쟁이와 검은 비단치마를 집어 들었다. 엄마는 ‘이거 저 주세요’ 하는 무언의 내 표정을 알아차리셨다. 비단치마는 원래 검은색이 아니었다. 여러 번 빨아서 옅은 색의 비단이 빛을 잃자 염색을 해서 입었는데 그 색마저 낡아 검은색이 된 것이다. 비단치마는 엄마가 30대부터 손바느질로 뜯고 만들기를 수없이 반복한, 엄마의 손에 길이 든 그런 옷이었다. 비단치마에서 어떤 기품 같은 것을 느꼈다면 과장일지도 모르겠다.
“그래 네가 간직하렴.”
엄마보다 더 엄마처럼 느껴졌다. 그 치마를 받고 신이 나서 출장 가는 길에 백에 넣어갔는데 마침 저녁모임이 있었다. 외국에선 한복을 입는 것이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서 허리에 걸쳐 치마끈을 동이고 위엔 단순한 니트를 입었다. 근사한 파티복이 되었다. 부드러운 촉감과 작은 무늬가 여성스러워 좋았다.



![[카드뉴스] 품위 있는 노후를 위한 7계명](https://img.etoday.co.kr/crop/345/230/2013021.jpg)









![[카드뉴스] 83세 화가 데뷔한 할머니](https://img.etoday.co.kr/crop/345/230/201347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