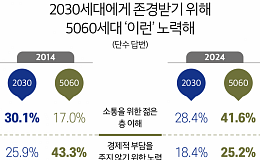[커버스토리] PART 07 누구나 고수가 될 수 있다

우연히 시작했다. 글을 낭송하는 것이 작품의 의미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였다. 그러나 내 글을 낭송하려니 쑥스러웠다. 작품이 좋아야 감명도 큰 것이어서 주로 좋은 작품을 골라 낭송하고 있다. 아직 고수는 아니고 순수 아마추어다. 1년에 두 번 정기공연하고 낭송 요청이 오면 가기도 한다. 낭송팀을 꾸린 것이 벌써 7년이 되었다. 현재 같이 활동하는 사람은 13명이다.
7~8분 분량의 수필을 외워 낭송하는 일은 연극배우가 무대에서 대사를 소화하는 것과 비슷하다. 시와 달리 적당한 길이감이 아쉽지도 않고 은유가 많지 않아 이해하기도 쉽다.
무대에 오르면 관객의 이목이 쏠리고 조명이 눈부셔서 간혹 긴장한 나머지 내용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잊어버리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지나쳐 현실이 되는 것 같다.
무대에 오르기 전에는 대본을 봐도 머리에 잘 안 들어온다. 불안을 키울 수도 있으니 아예 대본을 덮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 관객 모르게 막힌 부분을 알려주는 경우도 있는데 알려주는 사람도 무대 위 낭송자도 요령이 필요하다.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려고 우물거리면 못 알아듣고 너무 크게 소리 내면 관객이 알아채기 때문이다. 낮고 정확하게 포인트가 되는 단어 하나만 알려주면 된다.
노련한 낭송자는 애드립을 칠 줄 안다. 낭송하다 막히면 당황하지 않고 비슷한 단어로 대체해버린다. 또 문장이 잠시 생각나지 않으면 같은 문장을 반복하며 다음 문장을 기억해내기도 한다. 오직 작품에만 몰입해 작가의 마음으로 빙의되어야 한다. 그러면 혹시 내용을 잊었다 해도 어떻게 애드립을 쳐야 할지 저절로 알게 된다. 억양이나 높낮이도 낭송자의 해석에 따라서 결정되지만, 그 느낌은 독자의 몫이다.
마이크와도 친해져야 한다. 그래야 마이크 성능을 빨리 파악하고 거리를 조절할 수 있다. 마이크와 너무 가까우면 ‘푹푹’ 소리가 나면서 발음이 윙윙거려 알아들을 수가 없다. 소리가 너무 크면 안 들리는 것보다 귀가 더 빨리 피곤해진다. 마이크가 얼굴을 가리도록 높이 들거나 마치 노래방에서처럼 세워서 들면 보기 좋지 않고 잡음도 많이 난다. 조심할 일이다.
낭송에는 말맛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오버하면 역겹고 오글거린다. 또 밋밋하면 심심하다. 글 분위기를 최대한 살리는 톤을 찾아내야 하는데 낭송자의 목소리와 잘 맞는 글을 찾는 것이 소화하기 쉽다. 적당한 손짓이나 걸음걸이 그리고 표정도 중요하다. 작품의 성격에 따라 조절할 일이다.
낭송을 통해 사투리, 발음, 발성이 교정되고 또 좋은 작품을 외움으로써 얻는 효과도 크다. 새해에는 좋은 작품을 낭송하고 감상하는 작은 모임을 가져보려 한다. 옛 선비들이 달 밝은 정자에서 술잔 돌리며 시조 읊고 거문고 타던 것처럼.




![[카드뉴스] 인생 2막에 필요한 세 가지](https://img.etoday.co.kr/crop/345/230/2015285.jpg)
![[카드뉴스] 품위 있는 노후를 위한 7계명](https://img.etoday.co.kr/crop/345/230/201302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