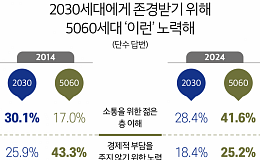일본 사람들의 단체생활은 남다르다. 자기보다 남을 배려하는 친절성도 그렇다. 그 버릇이 초등학교 시절부터 몸에 뱄음을 느끼는 계기가 있었다. 얼마 전 일본 여행에서 눈으로 직접 본 초등학생 등교 모습에서 그 이유를 발견했다. 마침 일찍 이동해야 하는 여행 일정이어서 학교에 가는 초등학생들을 버스 차창 밖으로 볼 수 있었고 우리나라와 다른 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등교 시간이면 자녀를 승용차로 데리고 오는 학부모의 차량이 정문 근처에 줄지어 서 있는 우리 모습과 사뭇 달랐다. 학교 주변에 사는 아동은 대체로 혼자 등교한다. 일본에서는 며칠을 지켜보았으나 혼자 학교를 오거나 학교 앞까지 승용차로 학부모가 데리고 오는 아동은 전혀 볼 수 없었다. 서너 명 또는 일곱여덟 명이 팀을 이루어 등교했다. 키가 다소 큰 아이(상급생)와 더 어려 보이는 학생(저학년) 서너 명이 줄을 서다시피 하여 등교했다. 상급생이 이웃에 사는 저학년을 데리고 온다. 눈에 띄는 노란 모자를 썼고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모자가 달랐다. 날씨가 추운 지역이었음에도 저학년으로 보이는 학동은 스타킹을 신었으나 긴 바지는 입지 않은 반바지 차림이었다. 단체 생활을 시작하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시작된 이러한 모습이 곧 조직사회를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는 훈련 과정으로 여겨졌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다. 일본인들의 단체 생활에 대한 태도가 진지해진 이유가 여기서부터 출발했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 속담을 어릴 때부터 들어왔고 의미가 중요함을 잘 알면서도 실천이 따라 주지 못했다. 부모의 사랑이란 변명으로 자립심을 옭매여 마마보이가 생겼고 최근엔 “할마보이” “할빠보이”란 신조어도 생겨났다. 자립심과 사회 적응력의 토대를 만들어가는 유소년 시절 교육의 중요성을 느끼면서도 실상은 그 방향과 다르게 행동해 왔다. 단체보다는 개인이 우선이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젊은이가 과연 단체적응력이 높을 수 있을까? 이런 환경에서 자란 젊은이가 법관이 되어서 형량을 선고해야 하는데 스스로 결정할 수 없어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본다는 우스개가 생길 정도에 이른 현실이다.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역할이 유소년 시절부터, 세 살 때부터 필요하다. 일본 여행에서 본 초등학생 등교 모습에서 많은 점을 생각하게 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삶의 지혜라면 단체생활 적응력을 키울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초등학교 시절부터 가정과 학교가 공동으로 만들어가야 할 과제가 아닐까.




![[카드뉴스] 인생 2막에 필요한 세 가지](https://img.etoday.co.kr/crop/345/230/2015285.jpg)
![[카드뉴스] 품위 있는 노후를 위한 7계명](https://img.etoday.co.kr/crop/345/230/2013021.jpg)